어느 공무원이 자기네 부서의 외국어 용어 사용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걸어왔다. ‘○○ 추진 TF’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문화연대에서 ‘TF’ 대신 적절한 우리말 용어로 바꿔 한글로 적으라고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다. 국어기본법에서는 공문서 등은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한글로 적으라고 한다. 사정을 들어보니 이미 2년 전부터 사용하던 사업 이름이고 몇 차례 그 이름으로 회의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사업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우리말로 쓰면 뜻이 달라지는 것 같단다.
사실 관계자들끼리만 쓰고 있는 일종의 전문용어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일이다. 영어를 쓰든 중국어를 쓰든 러시아어를 쓰든 자기들끼리 소통만 된다면 무슨 문제겠는가. 하지만 공무원들도 자기 사업을 널리 알리고자 보도자료라는 것을 낸다. 이 보도자료가 언론을 타면 그 사업은 자기들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로 바뀐다.
상품을 파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은 왜 자신의 사업을 알리려고 할까. 먼저 국민에게 알려서 사업 추진에 협조를 구하고 그 사업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고려하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자신의 활동과 실적을 알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일 것이다. 매우 자연스러운 동기다.
문제는 사업 이름이나 내용에 국민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들어 있을 때 생긴다. 사업은 알려지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업을 꾸리는 자기들 존재를 알리는 데에는 성공한 것이지만 어떤 국민에겐 정보 제공은커녕 자칫 모욕감을 줄 수도 있다. 공용어가 한국어인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만 알면 공공정보에 접근하는 데 문턱이 없어야 하건만 불쑥 튀어나오는 외국말 돌기둥에 정강이를 까이면 어떤 국민은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불만을 제기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무식’을 드러내는 꼴은 아닐까 주눅이 드니 더 모멸적이다.
언론에서도 ‘TF’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명이나 보도자료에 이 말을 쓰면 안 될 까닭이 있냐고 항변하는 공무원이 있지만, 언론에선 그런 말을 먼저 만들지 않는다. 관공서에서 나오는 보도자료에 그렇게 적혀 나오니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언론에서 그렇게 공식화되면 다른 관공서에서도 거리낌 없이 그 외국어 용어를 쓰게 된다. 다른 외국어 용어에도 주저함이 없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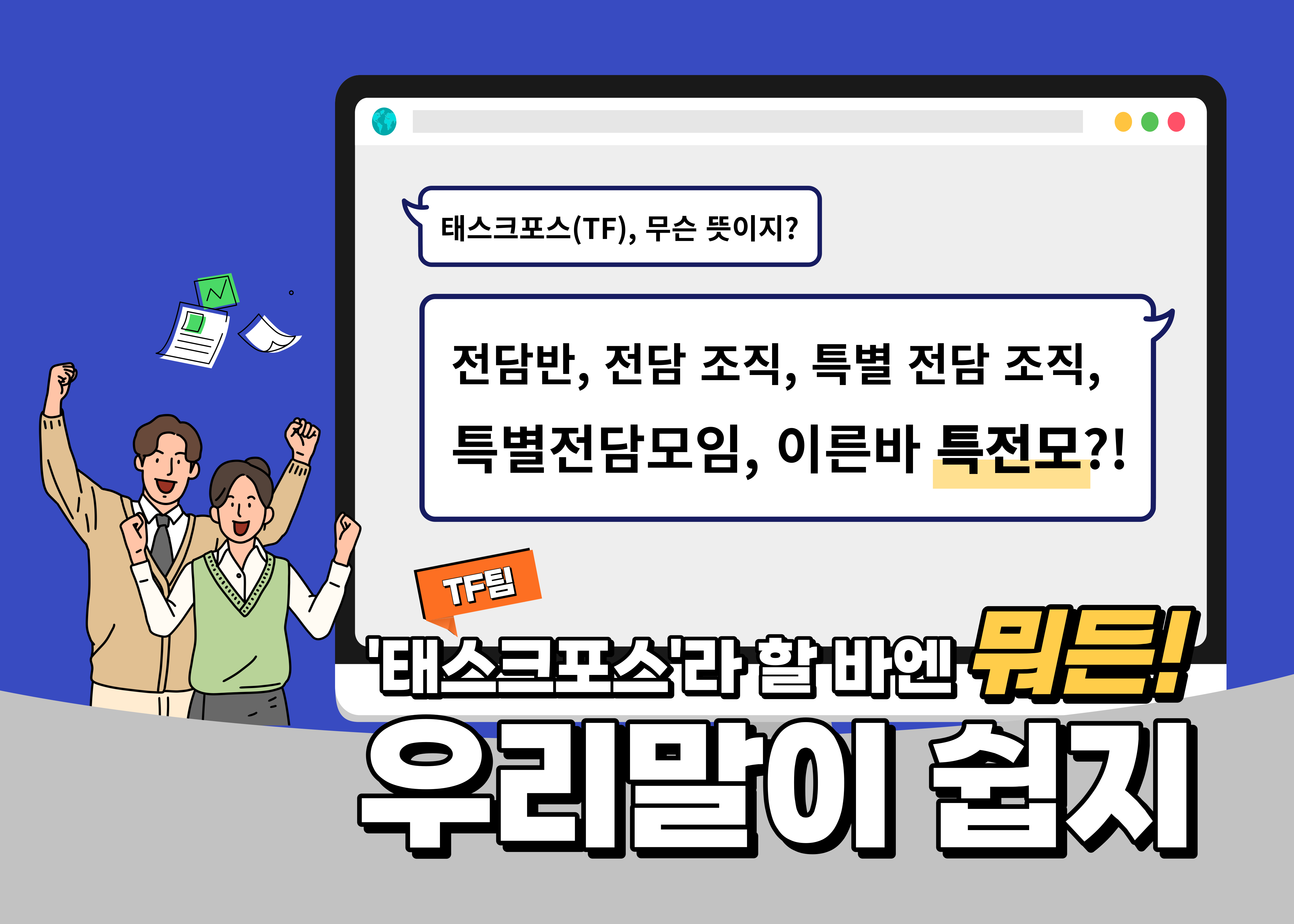
‘태스크 포스’의 줄임말인 ‘TF’는 어떤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조직 각 부문의 인재를 모아 일을 진행하는 특별전담모임을 뜻한다. ‘특전모’라고 줄여 불러도 될 것이다. ‘모’는 이미 110년 전 주시경 선생이 ‘한글모’라고 모임 대신 줄여 쓴 말이다. 이런 이름이 그동안 없었으니 운영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른바 ‘TF’와 뜻이 달라질 까닭도 없다.
구체적 사물이 아니라면 어떤 용어나 이름이 그 존재나 개념의 특성을 모두 담아낼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법률가들은 법률 용어를 조금이라도 바꾸면 법률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 일본 한자어투성이인 우리네 민법을 그대로 두자고 고집한다. 영국에서도 그랬다. 하지만 쉬운 영어 사용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에 힘입어 2000년대에 들어서 영국 법률은 계속 쉬운 영어로 바뀌고 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쓰자는 움직임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영국과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던 나라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쉬운 말 사용에 힘을 쏟고 있다. 언어를 인권으로 보는 시각이다. 외국어 남용에 문제를 제기하면 국수주의로 매도하는 낡은 사고는 이런 보편적 흐름을 놓치고 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작가
'우리말을 배우자 > 한글문화연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글 상식]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를 감독했다고? (0) | 2022.06.14 |
|---|---|
| [한글 상식] 유성음, 무성음 (0) | 2022.06.13 |
| [한글 상식] '서슴지', '익숙지', '넉넉지' (0) | 2022.06.11 |
| [한글 상식] 광화문 현판 한글로! (0) | 2022.06.10 |
| [한글 상식] 기역 디귿 시옷의 이름을 바꿔라 (0) | 2022.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