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사전은 국어의 어휘를 한데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그 뜻과 품사, 어원 등을 풀이한 책을 말한다. 19세기 말부터 파리외방전교회의 『한불자전』(1880), 언더우드의 『한영자전』(1890), 게일의 『한영자전』(1897),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1920) 등 한국어 어휘를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풀이한 이중어사전들이 편찬되었지만 한국어 어휘를 한국어로 풀이한 사전은 1938년에야 출간되었다. 바로 문세영이 편찬한 『조선어사전』이다. 그에 앞서 1925년에도 경성사범학교 교사 심의린이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을 펴낸 바 있지만 이는 보통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습 사전으로 일반 사전이 아닌 특수 목적 사전이었다. 교과서에 나온 어휘만이 아니라 한국어 어휘 전반을 망라한 국어사전으로서는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이 최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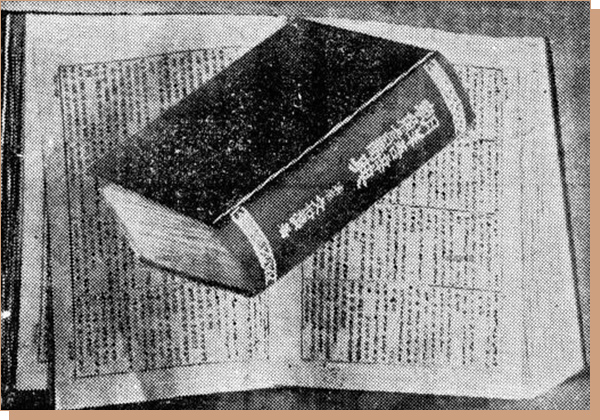
▲ <그림 1> 문세영의 『조선어사전』 초판(1938. 7. 20. 조선일보 3면)』
청람(靑嵐) 문세영(文世榮, 1888-?)은 배재고등보통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9년간 10만여 개 어휘를 모아 사전 원고를 집필했다.


▲ <그림 2> 『조선어사전』 원고 뭉치(1938. 7. 12. 조선일보 3면)
『조선어사전』에 대한 세간의 반응은 뜨거웠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일간지들은 조선 사람에 의한 최초의 조선말 사전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국어학자 방종현이 『조선일보』 1938년 7월 22일 자에 발표한 글에서 “이 아름다운 책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니 오직 기쁨과 감사가 있을 뿐이다.”라고 한 것처럼 학계에서도 『조선어사전』의 출간을 환영하였다. 그뿐 아니라 지방의 독자들로부터 전국 각지의 방언과 기타 누락된 어휘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 문세영은 이러한 제보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오류를 수정하여 1940년 12월에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을 발행하였다.

증보 과정에서는 방언 어휘가 대거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초판에는 표준어 ‘가위’에 대응되는 방언으로 ‘가새, 가시개, 가시새, 강애’만 실려 있었는데 수정증보판으로 오며 ‘가에’와 ‘가웨’가 추가되었다. 또한 초판에는 표준어 ‘비탈’에 대응되는 방언으로 ‘벗비슬, 비냥, 삐딱, 빈탈, 어더락, 언장, 여부래기, 옆댕이’만 실려 있었는데 수정증보판으로 오며 ‘가풀막, 개드락, 네리마기, 네림바디, 밴달, 빈달, 석집은따, 언지츰’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독자들의 제보에 힘입어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용되던 방언 어휘가 풍부하게 수록될 수 있었다.

▲ <그림 3> 수정증보판을 다룬 기사
(1939. 4. 21. 동아일보 3면)
문세영이 『조선어사전』의 원고를 집필하던 1930년대는 한국어에 외래어가 대거 유입된 시기였다. 당시의 신문과 잡지를 보면 다양한 경로로 차용된 외래어들이 혼재하고 있었으며, 조선어학회의 ‘외래어표기법통일안’도 1940년대에 이르러서야 발표되었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의 혼란도 심각했다. 따라서 사전 편찬자로서는 다양한 변이형 중 어느 것을 사전에 수록할 것인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 예로, 당시에는 ‘Cream’의 차용어로 영어식 발음을 따른 ‘크림’, 일본어식 발음을 따른 ‘크리무’와 ‘구리무’, 프랑스어식 발음을 따른 ‘크렘’ 등이 쓰였는데 『조선어사전』에는 ‘크림’만이 등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문세영은 영어식 발음을 반영한 표기를 선호했다.


▲ <그림 4> 『조선어사전』의 본문
『조선어사전』에 실린 외래어는 당시의 최첨단 신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뜻풀이를 살펴보면 이들 신어가 지시적 의미 외에도 비유적 의미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어사전』의 뜻풀이에 따르면, 외교술을 뜻하는 ‘띠플로마씨’는 권모술수의 비유적 의미로도 쓰였고, ‘램프’는 둥근 모양으로 인해 대머리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무능한 상관은 ‘로보트’로, 장난꾸러기 꼬마는 ‘멍키’로 불리기도 했고, 사계절 중 제일 앞에 있는 ‘스푸링’은 이른 아침의 뜻으로도 쓰였다. 영을 나타내는 ‘제로’는 헛일의 비유적 의미로 쓰였고, 측량을 위한 ‘콤파쓰’는 가랑이의 기럭지에 비유되기도 했다. 이처럼 외래어의 풀이에 나타난 비유적 의미를 통해 당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외래 신어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글: 안예리(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
'우리말을 배우자 > 쉼표,마침표(국립국어원 온라인소식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전 두 배로 즐기기 -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국어사전 (0) | 2021.08.20 |
|---|---|
| 읽기 좋은 글, 듣기 좋은 말 - 말은 끝까지 (0) | 2021.08.18 |
| 국어원 30년 - 통일 한국어를 위한 준비 (0) | 2021.08.07 |
| 우리말 다듬기 - 전망쉼터는 스카이라운지를 다듬은 말 (0) | 2021.08.06 |
| 실전 국어 표기법 - '부치다'와 '붙이다' (0) | 2021.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