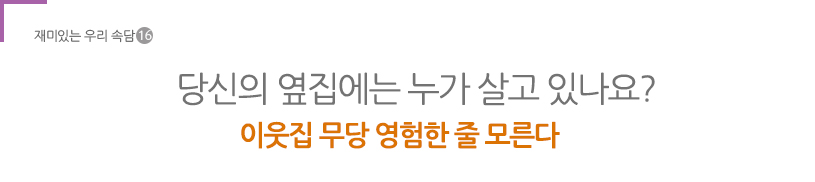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대신 돌봐 줄 사람을 미리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겨 놓고 나가야 할 때가 있기 마련이지요. 이런 때 아이를 맡아 주겠노라며 선뜻 손을 내밀어 주는 이웃은 멀리 떨어져 사는 피붙이보다도 더 반갑고 고맙기만 합니다. 그러니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겠지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도 아이를 낳고 난 후 이웃과 관계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파트 승강기를 타거나 아이의 자전거를 밀어 주며 문밖을 나서는 순간 아이 부모인 ‘나’는 몰라도 ‘아이’는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서너 살이 되어 동네 구석구석 삽살개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의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모른 척 스쳐 지나가던 이웃 할아버지께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이웃 할머니를 동네 경로당까지 차로 모셔다 드리기도 합니다.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이웃의 다른 엄마를 만나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폭풍 수다’를 떨기도 하지요.
덕분에 개인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도시 안에서 ‘품앗이 육아’나 ‘공동 육아’ 등의 공동체 활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개개인을 공동체로 너무 강하게 묶어 세우지도 않으면서 공동체가 와해될 정도로 관계가 너무 느슨하지는 않은, 그런 균형감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으면서도 돌봄과 보살핌의 정서, 혹은 따뜻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적 관계를 누구나 꿈꾸지만 이를 실현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귀농을 한 지 일 년쯤 된 분이 귀농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른 아침이나 밤 늦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웃들의 방문을 꼽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웃의 자상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가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때로 사적인 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까우면서도 멀지 않은 적절한 관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웃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비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웃집 나그네도 손볼 날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으로 허물없이 지내더라도 격식을 갖춰 손님으로 만나야 할 날이 따로 있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조심스럽게 배려해 가며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깝게 지내다 보면 서로 볼 것 못 볼 것, 보여 줄 것 보여 주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 없이 드러내게 되니까요. 오죽하면 옛말에 ‘이웃집 며느리 흉도 많다’고 했겠습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결점을 알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가까울수록 많은 걸 보게 되고 오래도록 반복해서 같은 문제를 보게 되면 서로에 대한 선입견이 강해져 새로운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점점 나쁜 점만 또렷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웃집 무당 영험한 줄 모른다’는 말이 이런 정황을 잘 보여 줍니다. 이 속담은 이웃집 무당이 우리 집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나에 대한 그의 모든 조언이 영험한 신통력에서 나오는 것인지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면서 알게 된 정보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나 역시도 옆집 사는 무당을 이웃 사람으로만 대하다 보니 그의 신통한 능력이나 무당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평범한 이웃으로 만나 왔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관성화된 시선이나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웃의 새로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쁘게만 바라보던 이웃에게서 뜻밖의 감동과 존경을 느끼기도 하고, 믿고 지내던 이웃에게서 아픈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웃집 새 처녀도 내 정지에 들여 세워 보아야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웃으로 가까이 지내더라도 함께 일을 해 보거나 생활을 나눠 보아야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만나지 않고서야, 함께 하지 않고서야 사람을 알 도리가 없지요. 물에 발을 적셔야 강을 건너고 바다에 들어가야 고기를 낚는 법입니다. 오늘, 스쳐 가는 이웃에게 간단한 눈인사만 건네지 말고 이웃과 함께 재미난 놀잇거리, 보람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글_김영희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우리말을 배우자 > 쉼표,마침표(국립국어원 온라인소식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역사 속 우리말 - 장지영 (0) | 2022.08.06 |
|---|---|
| 방언 말모이 '가위' (0) | 2022.08.05 |
| 찰나의 우리말 - '당신'은 '너'의 높임말 아닌가요? (0) | 2022.08.02 |
| 무애 양주동 (0) | 2022.08.01 |
| 우리말 속 차별 언어 - 성별과 관련된 표현 (0) | 2022.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