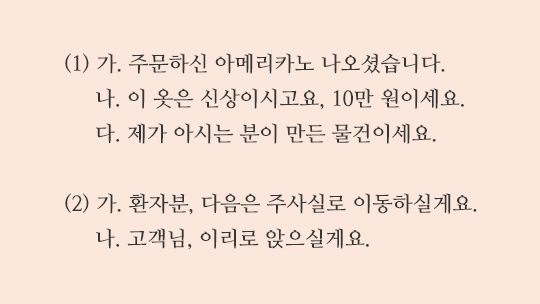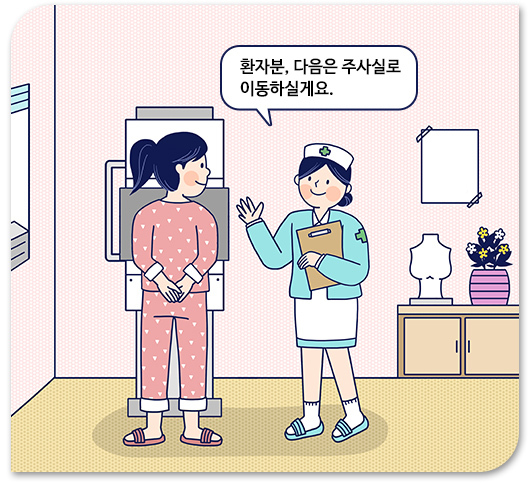그날도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니터를 응시하며 열심히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쓰던 원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눈동자는 모니터에 꽂아 두고 손을 뻗어 전화기를 들었다. 학교 행정직원 선생님의 목소리다. 필자에게 전할 서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그 직원 선생님은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교수님, 혹시 지금 연구실에 계실까요?”
이 질문에 필자는 당황했다.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서였다. 누가 연구실에 있느냐고 묻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필자에게 가져다줄 서류가 있다는 내용임을 파악한 후에는 전화에 집중을 하지 않았기에, 집중하지 않은 동안 필자가 맥락상의 주어를 놓쳤나 보다 생각했다.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질문을 정확히 알아야 답을 할 수 있었기에 “어, 죄송한데 누가요?”라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필자의 반문에 직원 선생님은 몹시 당황하는 것 같았다. 당황해하는 직원 선생님의 반응에 필자도 몹시 당황스러웠다. 필자가 연구실에 있느냐고 물은 것임을 눈치채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계속 연구실에 있을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잘 생각해 보니 행정직원 선생님의 말이 또 그렇게 아주 낯선 말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빈번히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아주 가까운 주변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비슷한 낯섦을 느낀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도 분명히 맥락상으로는 필자에 대해 묻는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 묻는 것처럼 물어서 잠시 당황을 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보통 ‘계실까요?’처럼 ‘-ㄹ까요’를 써서 질문하면 이것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묻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까요?”나 “철수가 집에 있을까요?”와 같이 말이다. 반면에 앞의 질문처럼 청자에게는 확실한데 화자에게는 불확실한 경우에는 ‘-ㄹ까요’를 쓰지 않고 ‘-ㄴ가요’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계실까요’ 대신에 ‘계신가요’를 쓰는 것이 한국어 문법에 맞는다.
직원 선생님은 물론이거니와 유사한 말을 했던 필자의 주변 인물은 모두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국어 문법을 몰라서 문법에 맞지 않은 말을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즉, ‘-ㄹ까요’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ㄴ가요’ 대신 ‘-ㄹ까요’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공손성’ 때문이다. ‘-ㄴ가요’보다는 ‘-ㄹ까요’를 씀으로써 ‘-ㄹ까요’가 지니는 추측의 의미나 상대의 의견 청취와 같은 공손한 태도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말을 사용한 이유는 문법성을 훼손하더라도 공손성을 획득할 수 있다면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문법성을 훼손하더라도 공손성을 획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이득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공손성이 문법성을 이기는 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주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다음에 보인 예들이다.
(1)과 (2)에 보인 예들은 서비스 영역에서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 말들이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 왔다. 하지만 그 많은 지적에도 이 말들은 위축되기는커녕 서비스 영역에서 위세를 떨치며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1)에 보인 말들을 두고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존대한다고 혀를 차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심지어 (1다)의 ‘아시는’에서처럼 물건을 존대하는 것을 넘어 화자 자신을 존대하는 문법적인 오류를 범한다고 아무리 지적해도, 듣는 사람이 더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문법을 지켜서 청자의 심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문법을 어기는 쪽이 훨씬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2)에도 물론 문법을 어겨서 공손성을 획득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 (2)는 모두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환자분’이나 ‘고객님’에게 명령문을 사용해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청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 조심스럽다. 보통 이럴 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 명령의 기능을 하는 의문문이다.
하지만 의문문도 듣는 사람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니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 그렇다면 평서문으로 행동을 요구할 수는 없을까? 이런 전략에서 (2)와 같이 문법성을 훼손하지만 공손성을 획득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문법적으로 이상한 말을 쓴다고 아무리 지적한다고 해도 공손성을 획득해서 ‘환자분’이나 ‘고객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따져 봐야 할 것이 있다. 왜 우리가 ‘나왔습니다’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오셨습니다’까지 가야만 하는가, 또 ‘이동해 주세요’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동하실게요’까지 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다. 혹시 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갑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공손성이 문법성을 이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 왜 비문법적인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혹시 공손성이 문법성을 이길 수밖에 없는 배경에 일상 속 갑질과 같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