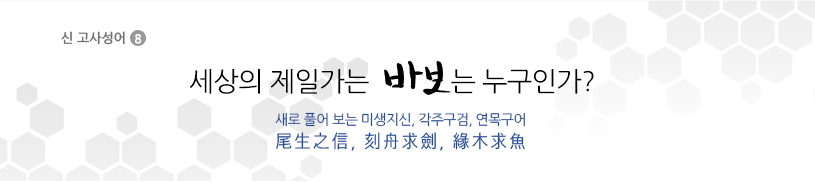언젠가 세상의 삼대 바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미생지신, 각주구검, 연목구어에 나오는 남자들이라고 했다. 누가 한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이 남자들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얼마나 바보 같길래 고사로 남고, 그래서 두고두고 놀림을 받는가. 먼저, 미생지신. ‘미생의 믿음’이라는 뜻이다. 미생이라는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과 다리 아래서 만나기로 한다. 여인은 오지 않는다.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점점 더 굵어진다. 미생의 허리, 가슴, 목까지 물이 된 비가 차오른다. 그러나 미생은 자리를 떠날 수 없다. 떠나지 않는다. 결국 익사한다. 다음, 각주구검의 남자.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바다에 빠트린 한 남자가 있다. 칼을 건져 보려 하지만 실패. 남자는 품에서 다른 칼을 꺼내더니 배에 무언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