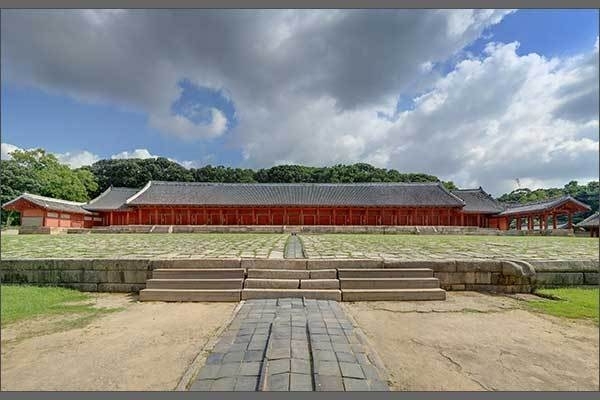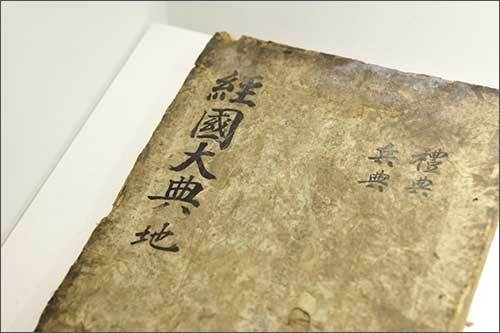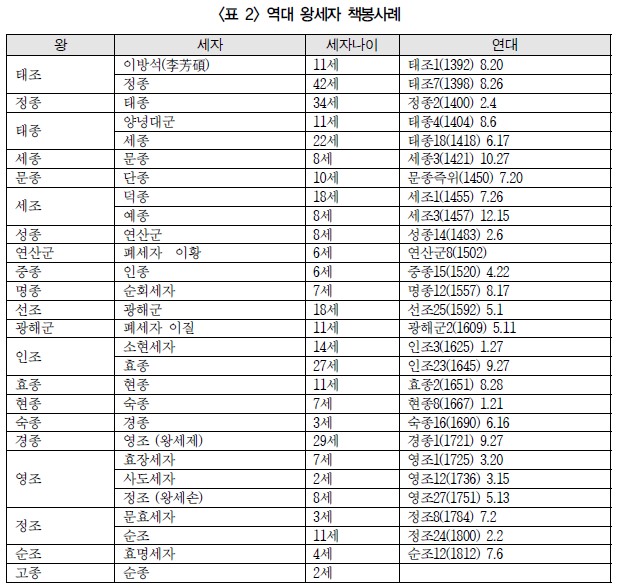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08년~2009년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 터의 무연고 여성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모두 52건 71점 가운데 사료적 값어치가 있는 10건을 국가민속문화유산 「남양주 16세기 여성 무덤 출토복식」으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복식 유물은 16세기 중기 복식 연구 자료로서 값어치가 높으며, 당시의 복식과 장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유물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직금사자흉배 운문단 접음단 치마’는 조선전기 연금사(撚金絲)*로 비단 바탕에 무늬를 짜 넣어 만든 사자흉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16세기 단령*이나 원삼* 등 남녀 예복용 포에 사용했던 옷감을 하의인 치마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처음 발견된 사례자, 해당 치마의 겉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