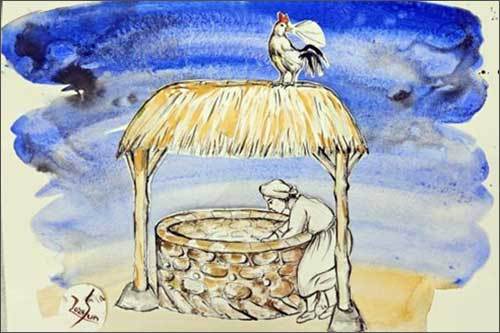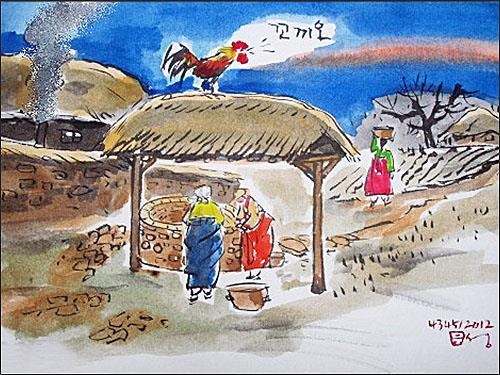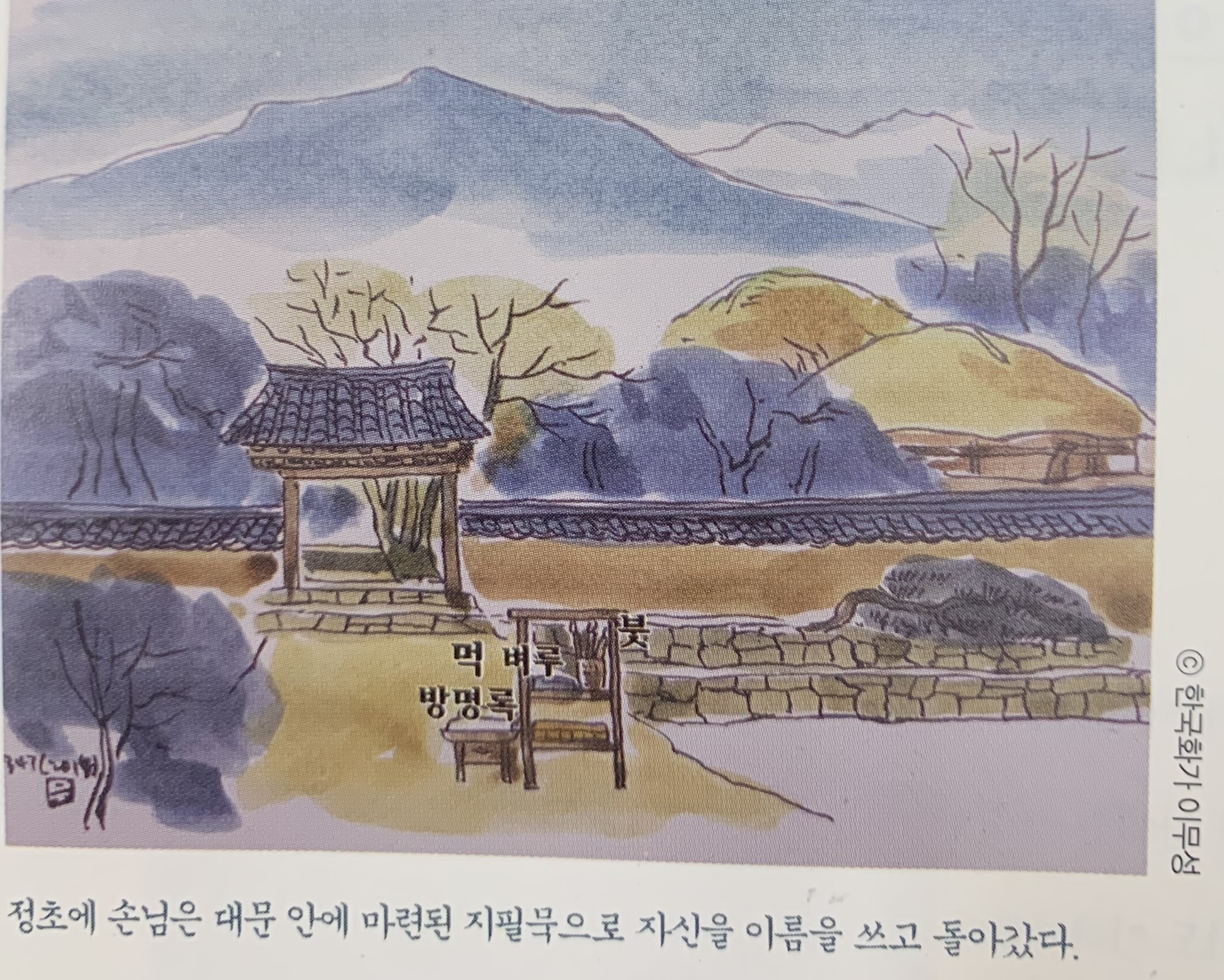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사)생전예수재보존회(대표 김종민)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한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이병우(李秉祐, 서울 서대문구)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서(生前) 미리(預) 덕을 닦는(修) 재(齋)’라는 의미로, 살아 있는 자가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례다. 앞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1973), 수륙재(2013)와 함께 불교를 대표하는 천도의식으로 자리 잡아 왔다. ▲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봉은사 생전예수재 봉송회향 장면 ▲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봉은사 생전예수재 택전의식 장면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봉은사 생전예수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