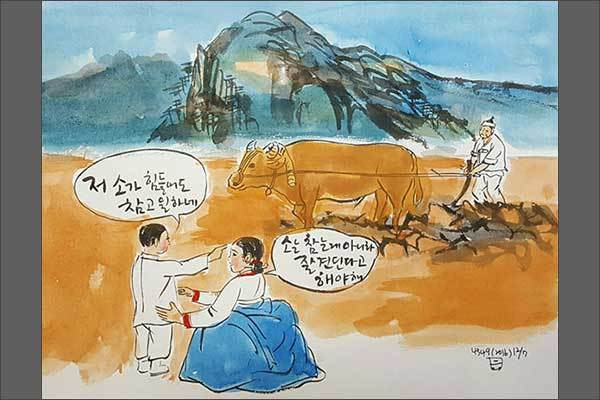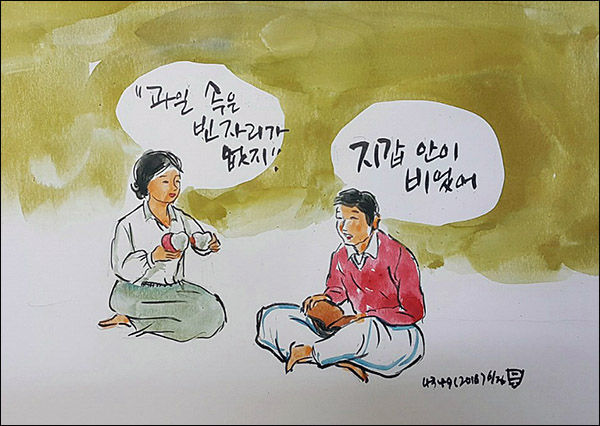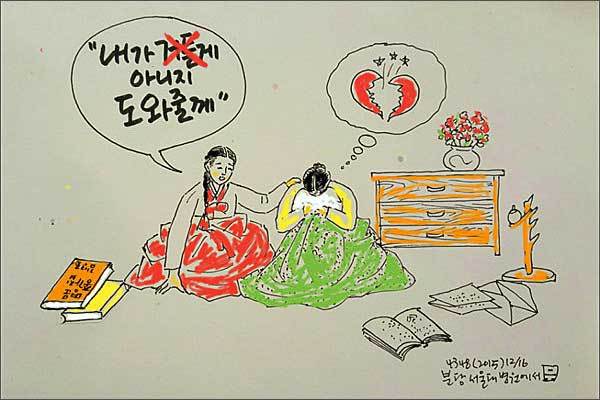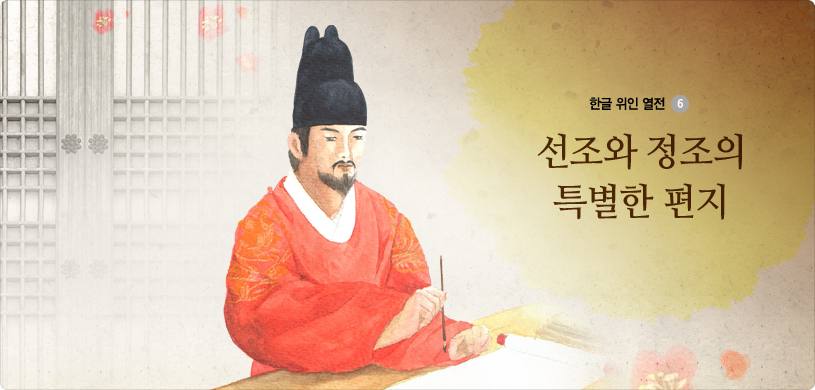‘참다’와 ‘견디다’도 요즘 아주 뜻가림을 못 하고 뒤죽박죽으로 쓰는 낱말 가운데 하나다. 국어사전들도 두 낱말을 제대로 뜻가림하지 못한 채로 쓰기는 마찬가지다. 1) · 참다 : 마음을 눌러 견디다.· 견디다 : 어려움, 아픔 따위를 능히 참고 배기어 내다. 2) · 참다 : 어떤 생리적 현상이나 병적 상태를 애써 억누르고 견디어 내다.· 견디다 :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잘 참거나 배겨 내다. 3) · 참다 : 웃음, 울음, 아픔 따위를 억누르고 견디다.· 견디다 : 사람이나 생물이 일정한 기간 동안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거나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면서 살아 나가는 상태가 되다. 보다시피 ‘참다’는 ‘견디다’라고 풀이하고, ‘견디다’는 ‘참다’라고 풀이해 놓았다. 3)《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두 쪽 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