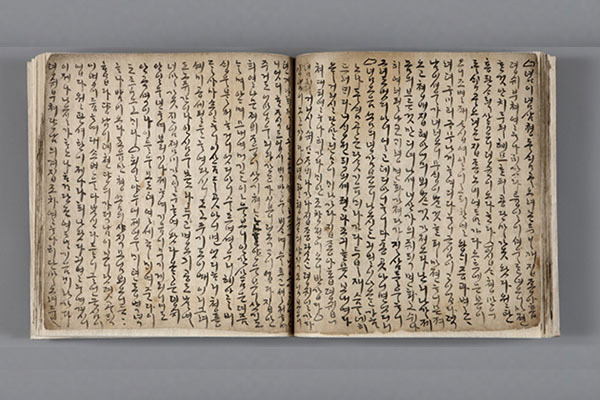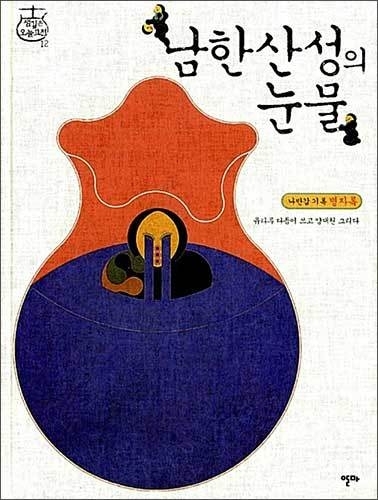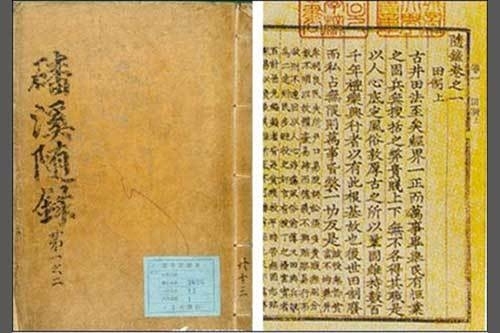박경민 작가의 《일본의 근대사 왜곡은 언제 시작되는가》를 보면서, 무능하고 비겁한 고종에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러다 보니 또 하나의 무능한 임금 인조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조를 다시 생각하다 보니 인조는 단순한 무능한 임금이 아니라, 살인자로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너무 과격하다고요? 왜 제가 그런 과한 생각까지 하는지,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조는 쿠데타로 집권한 임금입니다. 인조는 집권하면서 광해군의 외교정책을 전면 바꿨습니다. 광해군이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잘 펼쳤음에 반하여 인조는 청나라는 오랑캐 나라라고 오로지 명나라에만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이 청나라가 좋아서 균형외교를 펼쳤겠습니까? 당시 명나라는 지는 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