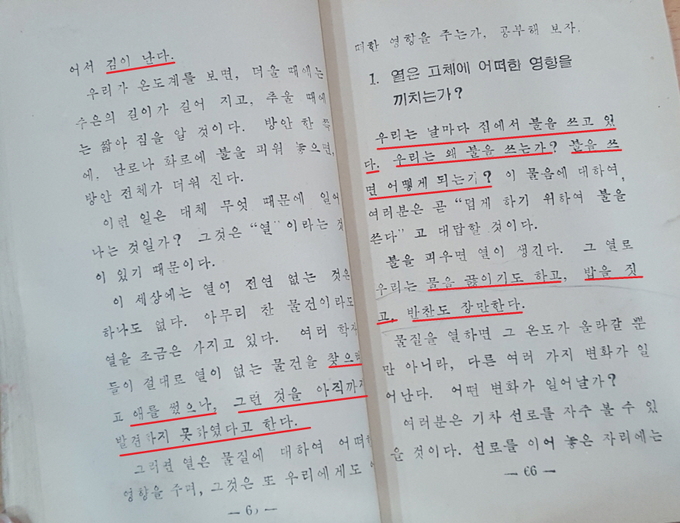우리나라는 기념일을 숫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삼일절, 사일구, 육이오 등 중요한 사건이나 누군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날들을 숫자로 기억한다. 다른 방법으로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만든 기념일도 있다. 예를 들어 축산업협동조합은 3이 겹치는 3월 3일을 삼겹살 먹는 날로 정하여 양돈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농촌진흥청에서는 5월 2일이 ‘오이’나 ‘오리’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 ‘오이데이’와 ‘오리데이’를 지정했다. 그런데 숫자 외에 우리말로 기념일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우리말 기념일은 어떻게 만들고 무슨 우리말로 표현하는지 알아보자.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말 기념일을 날짜를 바탕으로 만드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열두 개의 달과 삼십 개의 날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