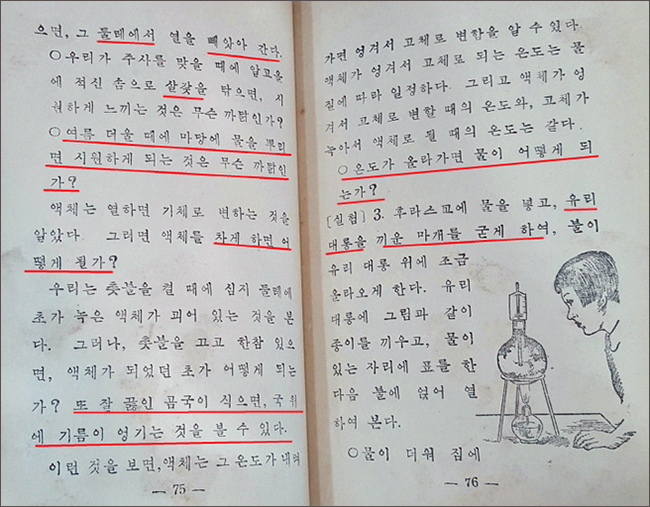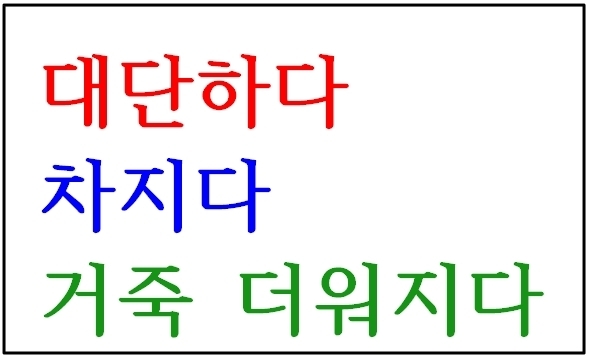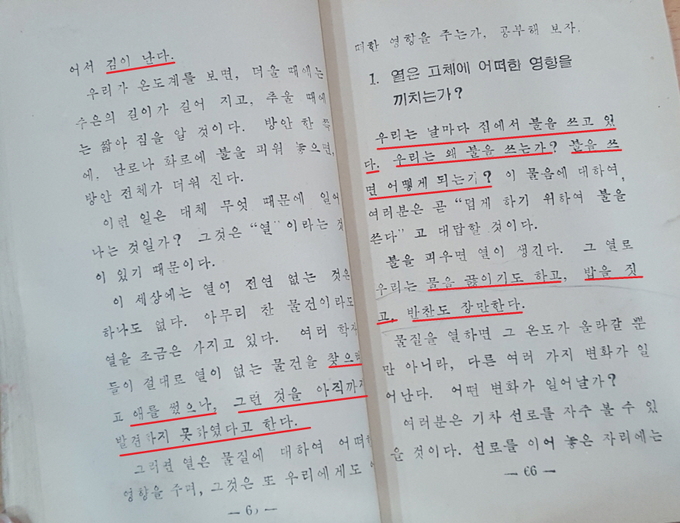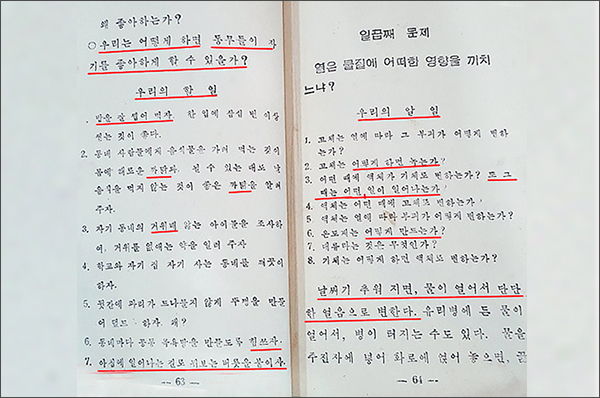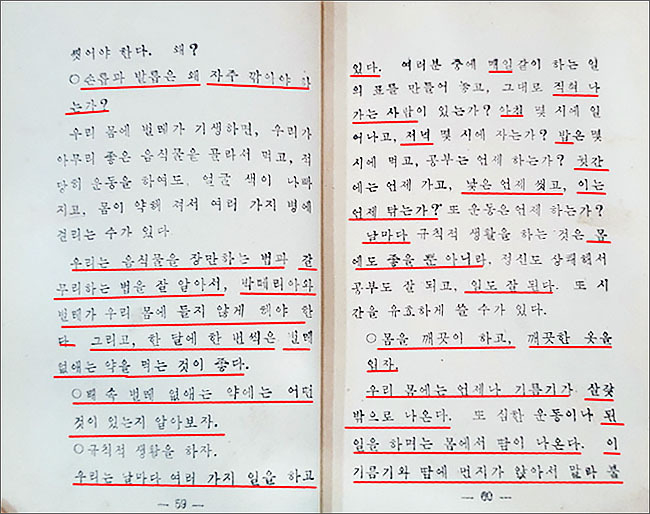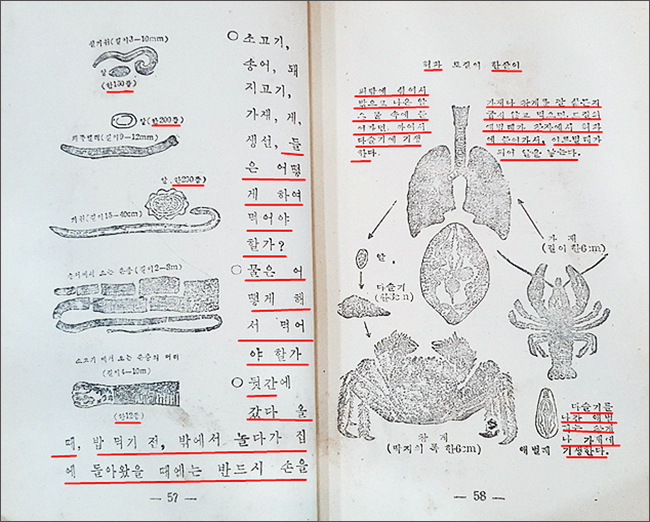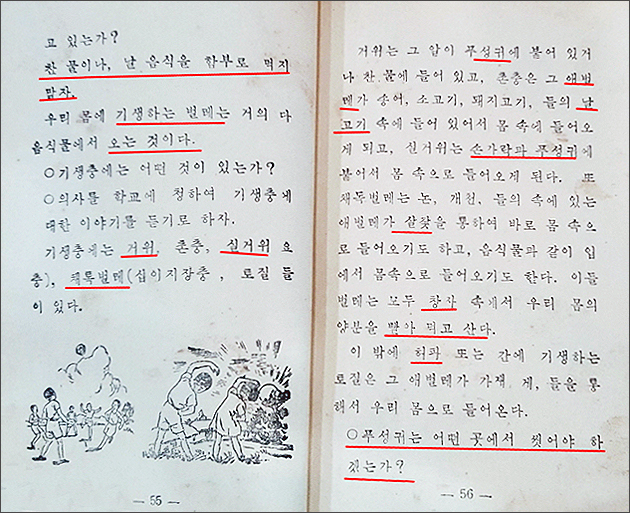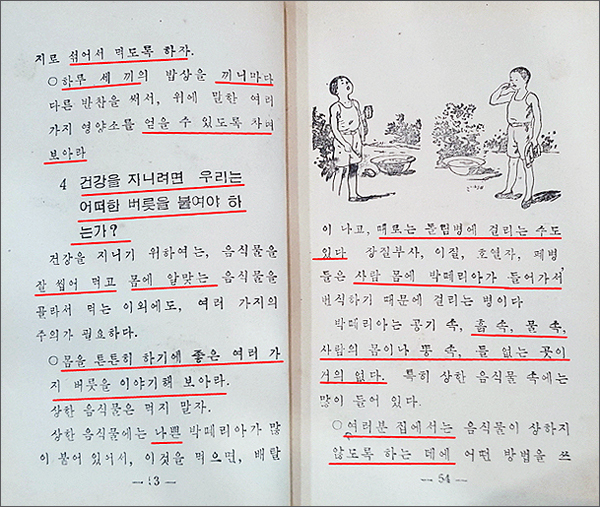오늘은 4285해(1952년) 펴낸 ‘과학공부 5-2’의 115쪽부터 116쪽에서 캐낸 토박이말을 보여드립니다. [우리한글박물관 김상석 관장 도움] 115쪽 첫째 줄에 ‘쉬 녹이 슬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쉬’는 ‘쉬이’의 준말로 ‘어렵거나 힘들지 아니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슬다’는 ‘쇠붙이에 녹이 생기다’는 뜻도 있고 ‘곰팡이나 곤충의 알 따위가 생기다’는 뜻도 있는 토박이말입니다. 넷째 줄에 ‘오래 견디는 것은’이 나오는데 여기서 ‘견디는’은 요즘 다른 책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유지되는’을 쉽게 풀어 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줄에 있는 ‘막으려면’도 ‘방지하려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말입니다. 여덟째 줄에 ‘입히면’이라는 말이 참 반가웠습니다. 요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