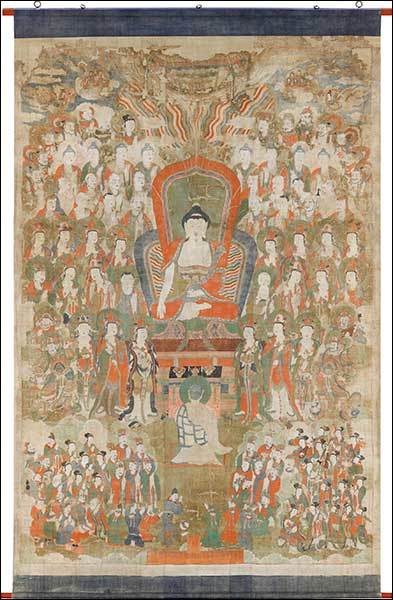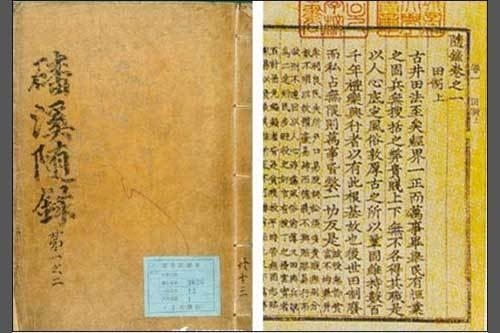지난 4월 9일 문화재청은 수도 성곽인 한양도성, 대피성인 북한산성과 함께 조선후기 도성 방어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유산인 「탕춘대성」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고 있는 「탕춘대성」은 3개의 성이 유기적인 하나의 도성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쌓은 독창적인 방어성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뒤 도성 방어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숙종 41년(1715년) 축조를 시작하여 영조 30년(1754년)에 완성하였지요. ▲ 탕춘대성(원경), 문화재청 제공 「탕춘대성」은 평시에는 성안에 설치된 군량 보관창고인 평창(平倉)을 지키고, 전시에는 평창(平倉)에 비축했던 군량을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에 보급하는 기지 역할을 하였다. 한양도성을 지키기 어려워지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