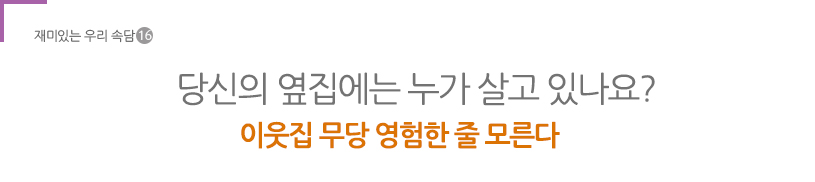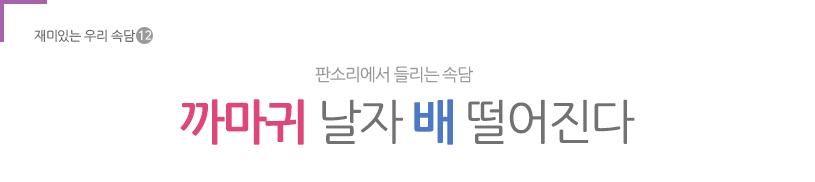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대신 돌봐 줄 사람을 미리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겨 놓고 나가야 할 때가 있기 마련이지요. 이런 때 아이를 맡아 주겠노라며 선뜻 손을 내밀어 주는 이웃은 멀리 떨어져 사는 피붙이보다도 더 반갑고 고맙기만 합니다. 그러니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겠지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도 아이를 낳고 난 후 이웃과 관계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파트 승강기를 타거나 아이의 자전거를 밀어 주며 문밖을 나서는 순간 아이 부모인 ‘나’는 몰라도 ‘아이’는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서너 살이 되어 동네 구석구석 삽살개처럼 돌아다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