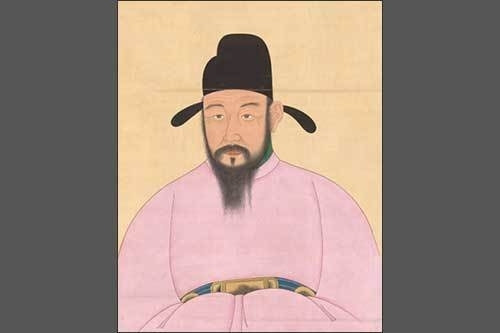“도박(賭博)놀이를 금지하라고 명하였다. 도대평(都大平) 등 16인에게 각각 장(杖) 80대를 때리고, 또 장용봉(張龍鳳)에게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그 스스로 서로 도박하여 얻은 물건은 관(官)에 몰수하였다. 대개 도박놀이는 고려 말년에 성행하였는데, 비록 큰돈이라도 하루아침에 도박하여 얻어서 벼락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경박한 무리가 요행히 따기를 바라고 이 짓을 하다가 처자(妻子)를 빼앗기고 가산(家産)을 탕진(蕩盡)하는 자가 있기에 이르니, 태조(太祖)가 먼저 그 놀이를 금지하였고, 이 때에 이르러 임금이 남은 풍속이 없어지지 않은 것을 듣고, 이에 유사(攸司)에 명하여 체포하고 엄중히 금지하였다.” 이는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1414년) 5월 19일 기록입니다. 이때로부터 4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