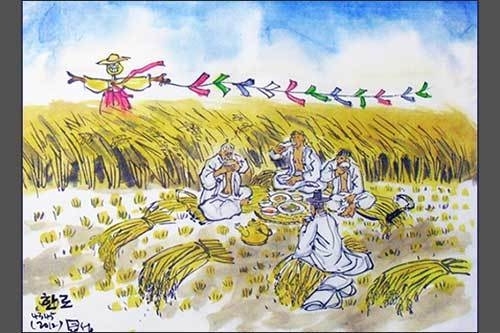내일은 24절기의 열아홉 번째인 입동(立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드는 때지요. 이때쯤이면 가을걷이도 끝나 바쁜 일손을 놓고 한숨 돌리고 싶지만, 곧바로 닥쳐올 겨울 채비 때문에 또 바빠집니다. 입동 앞뒤로 가장 큰일은 역시 김장인데 예전 겨울 반찬은 김치가 전부일 정도여서 ‘김장하기’는 우리 겨레의 주요 행사였습니다. 이때쯤 시골에서는 아낙들 여럿이 우물가에서 김장용 배추를 씻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지요. 잘 담근 김치는 항아리를 땅에 묻어두고 위에는 얼지 않게 볏짚으로 작은 집을 만들어 보관했는데 여기서 꺼낸 김치의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해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서울김장문화제”가 열린다. 입동 때는 김장 말고도 무말랭이나 시래기 말리기, 곶감 만들기, 땔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