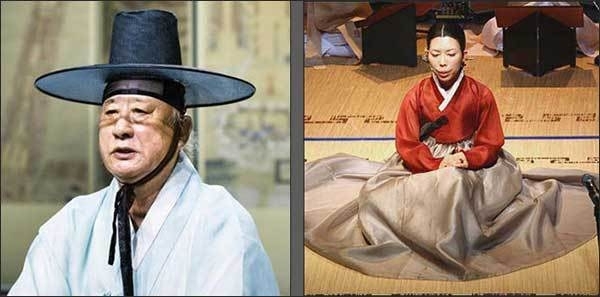한산 모시짜기는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의 전통 모시 직조 기술로 2011년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여름철 대표 직물인 모시의 재료가 되는 모시풀은 여름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는 풀입니다. 모시풀을 옷감으로 만든 것은 삼국시대부터로, 모시 제작은 약 1,500여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모시는 생육 환경이 까다로워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었는데 특히 한산면의 세모시가 품질이 좋고 제직 기술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한산은 서해와 금강을 끼고 있어 습도가 높고 기후가 온난하여 모시풀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지닌 지역입니다.한산 모시를 제작하는 과정은 태모시 만들기, 모시째기, 모시삼기, 모시날기, 모시매기, 꾸리 감기, 제직으로 이뤄집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