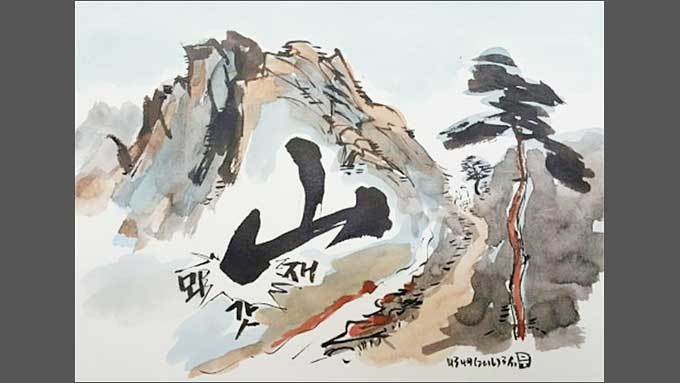‘할말’과 ‘못할말’은 국어사전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국어사전에 올라야 마땅한 낱말이다. 왜냐하면 우리 겨레가 오래도록 입말로 널리 썼을 뿐만 아니라, 말살이의 종요로운 가늠으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할말’과 ‘못할말’이 가려지는 잣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어우르는 사랑’이다. 그것에 맞으면 ‘할말’이고, 어긋나면 ‘못할말’이다. ‘사람을 어우르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동아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얽히고설켜서 겨루고 다투고 싸우기 마련이다. 그런 겨룸과 다툼과 싸움에는 사랑과 미움이 또한 얽히고설키게 마련이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며 마음이 맞으면 모여서 어우러지고, 서로 미워하며 마음이 어긋나면 갈라서고 흩어진다. 이럴 때 사람의 한마디 말이 멀쩡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