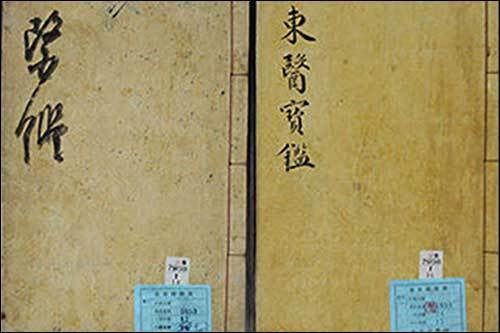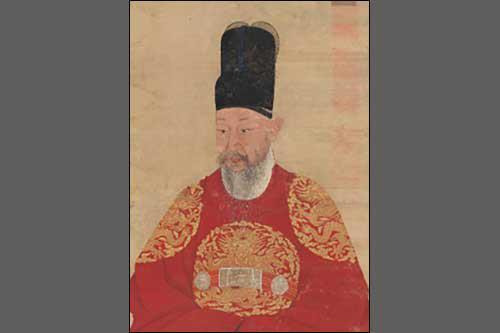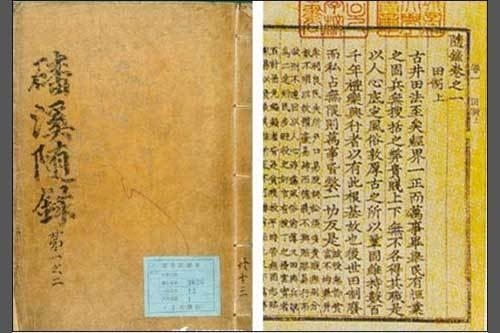"인삼장수가 만일 호조의 황첩(黃帖, 일정한 세를 물고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도 없이 사사로이 매매하면 해당 부사(府使)는 금고(禁錮, 관리가 되는 자격을 박탈하는 벌)의 율로 시행하라."하였다. 호조 판서 김상성(金尙星)이 일본(日本)의 예단(禮單)에 쓰일 삼을 채울 수 없다고 올렸는데, 대체로 인삼장수가 삼을 가지고 왜관(倭館)에 가서 매매하면 이익도 많고 황첩이 없으면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몰래 잠입한 자가 많았으므로, 동래 부사가 이들을 금칙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영조실록 76권 영조 28년(1752년) 4월 2일 기록입니다. ▲ 인삼 (사진, 개삼터인삼농장 제공) 또 “중국 배가 와서 시끄럽게 하고, 홍삼을 몰래 사가는 것을 단속하되,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