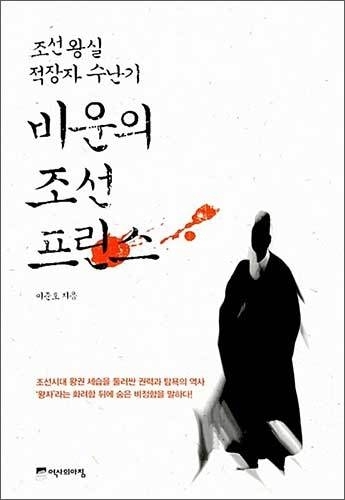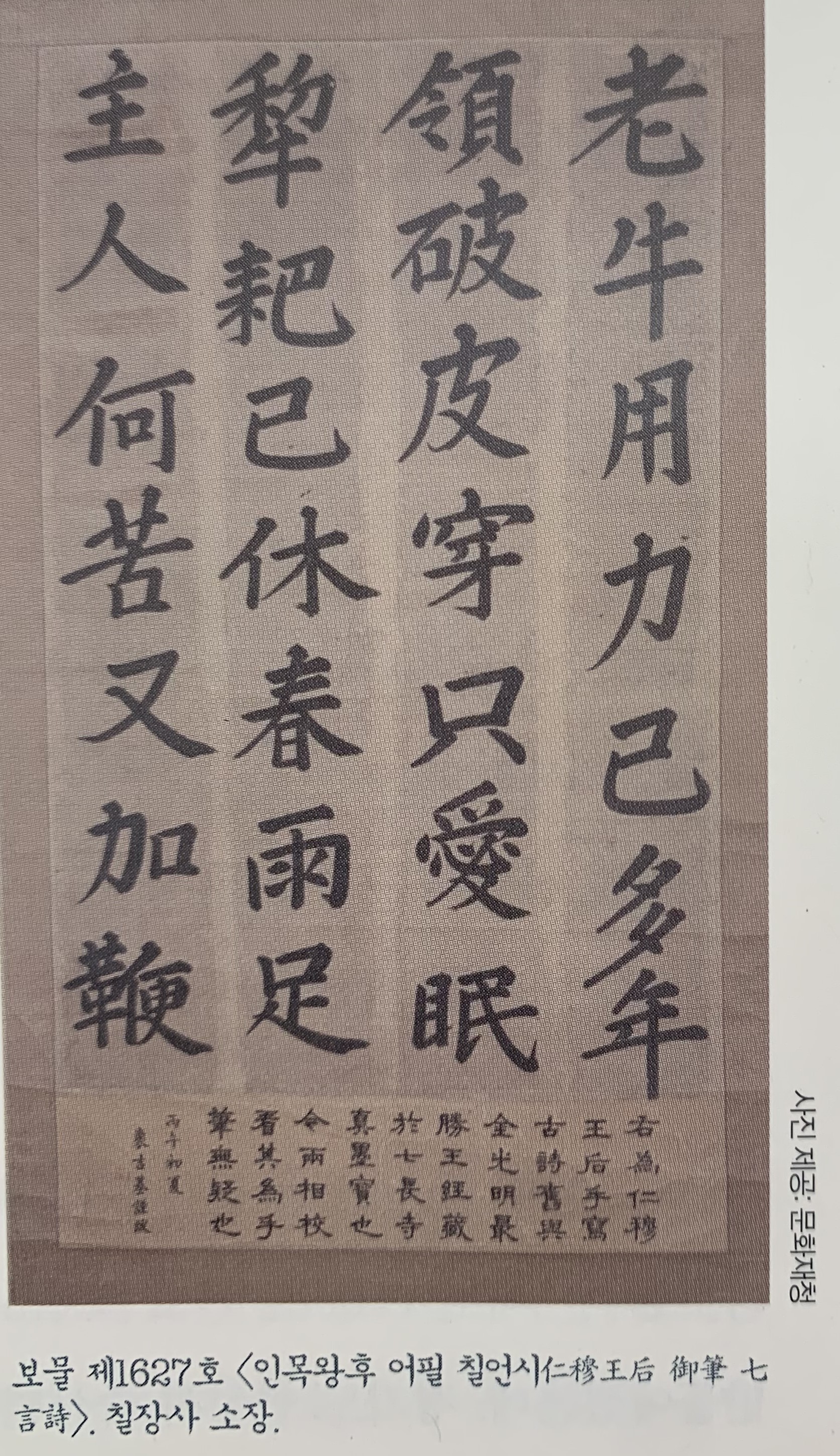‘임금이 승하한 뒤, 첫째 아들인 왕세자가 즉위한다.’ 얼핏 보아 당연한 듯 보이는 이 명제는 실현되지 못한 적이 훨씬 많았다. 조선 역사에서 임금이 승하한 뒤, 적장자로 왕위를 계승한 왕세자는 겨우 일곱 명에 불과했다. 조선왕조 스물일곱 명의 임금 가운데 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순종만 적자이자 장자로 왕위를 계승했으며 그나마 요절하지 않고 꽤 오랜 기간 정사를 제대로 펼친 임금은 현종과 숙종뿐이었다. 웬만한 기업에서도 ‘가업 승계’와 ‘후계자 양성’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한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 봉건시대에 ‘왕세자 책봉’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서자 출신 왕자들만 많거나, 서자 출신 왕자조차 거의 없거나, 적자 왕자는 있으나 군주가 지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