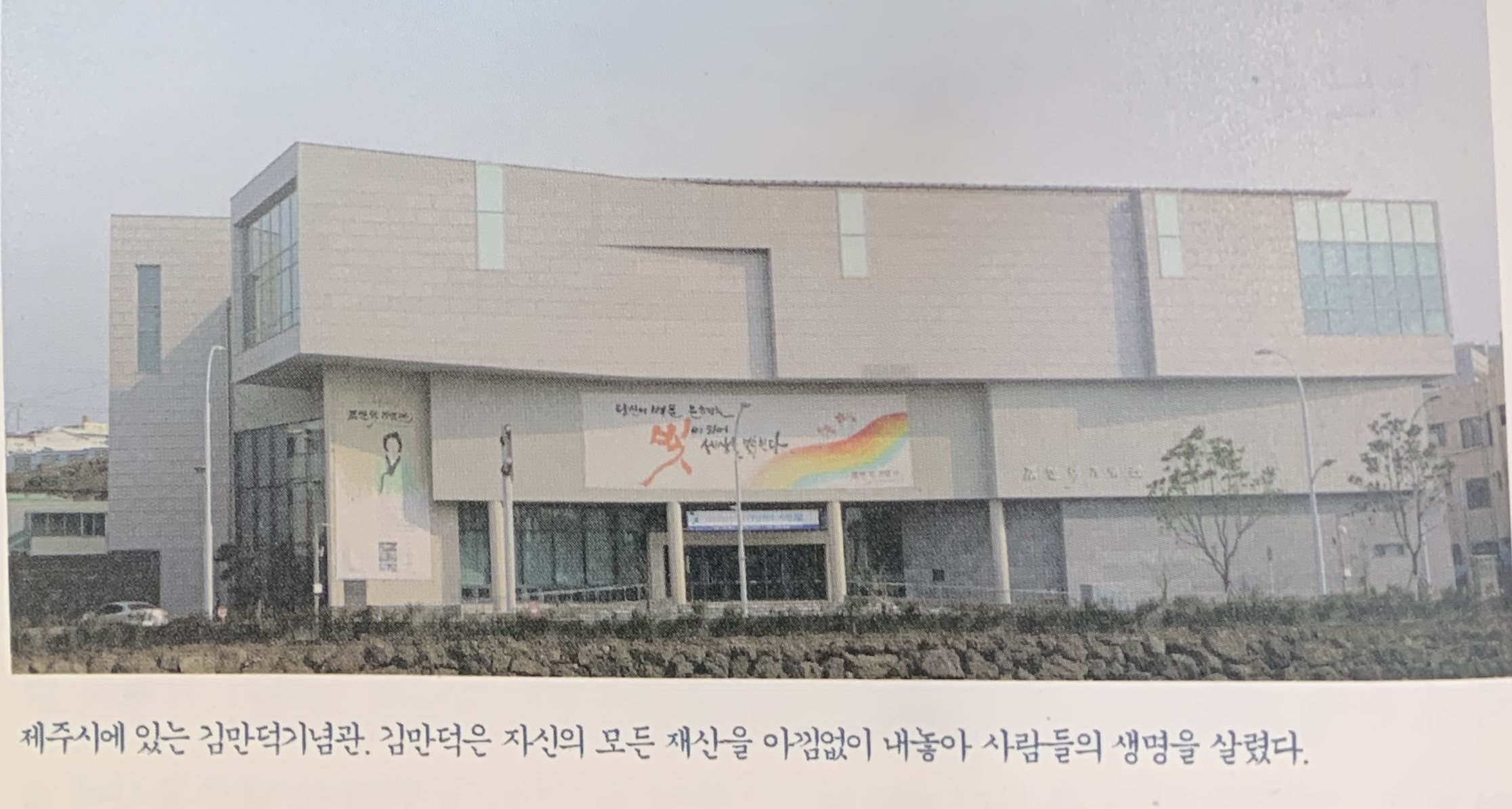노인들의 사회적 고립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은전염병과도 같다. 건강에도 나쁘다.앤지 리로이와 동료 연구자들은 200명 이상의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는지설문 조사를 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일반적인 감기바이러스를 투여한 뒤 격리된 호텔 방에서 지내게 하면서아픈 동안의 감정을 기록한 결과를 '건강심리학'지에발표했다. "아플 때 외로운 사람들은 덜 외로운사람들보다 더 기분이 나빠졌다."- 코니 츠바이크의 《오십부터 시작하는 나이듦의 기술》 중에서 -* 키에르케고르는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 했습니다.그러나 절망보다 더 괴로운 병이 '외로움'입니다.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적막감에 사람들은 힘없이 무너집니다. 특히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은 심각합니다.피땀 흘려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