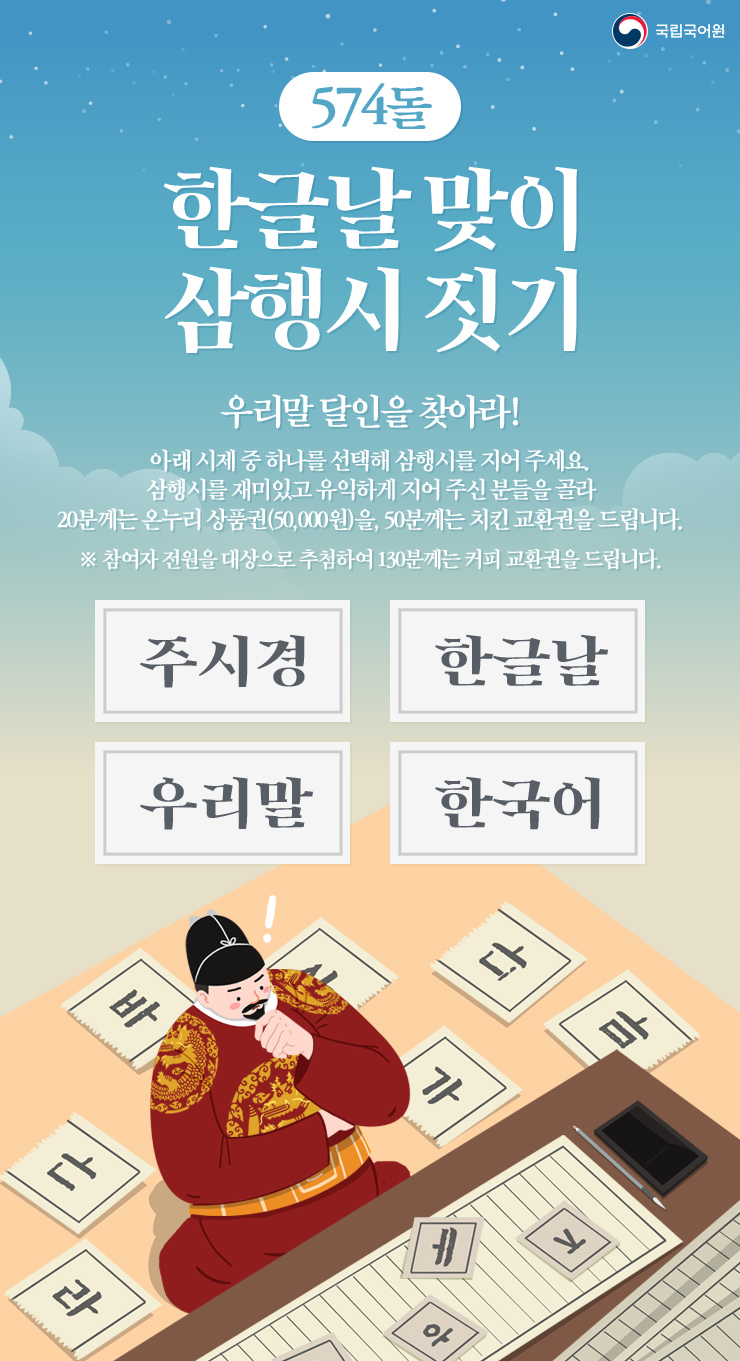'우리말글을 지키기 위한 조선어학회의 말모이 투쟁사'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를 잃으면서 우리말과 글도 함께 잃어 버린 시절에 우리말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선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학술단체로 등록하고, 자칫 친일파라는 누명을 쓸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말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에 마음이 아파오면서, 현재 우리는 우리의 글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는건지 생각해 보면 아니라고 하는 편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 우리의 글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야 할 방송에서조차도 틀린 용어나 정제되지 않은 외래어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 기자라는 사람들도 발음을 틀리고 문장에 맞지 않는 단어를 쓰는 모습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해방이 되었지만 남과 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