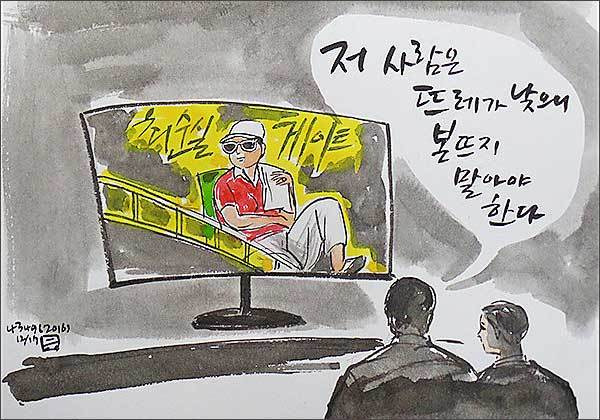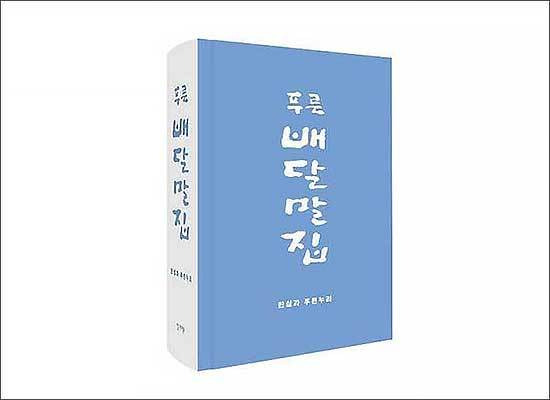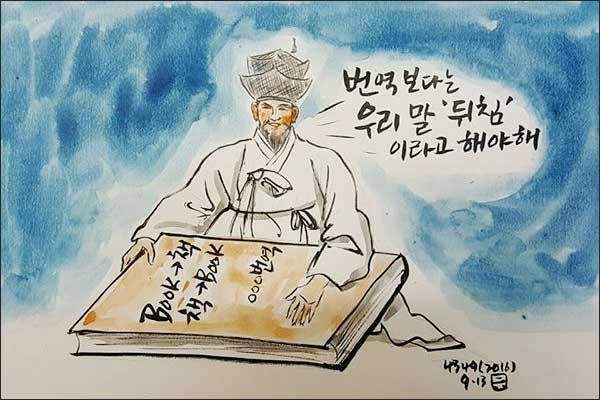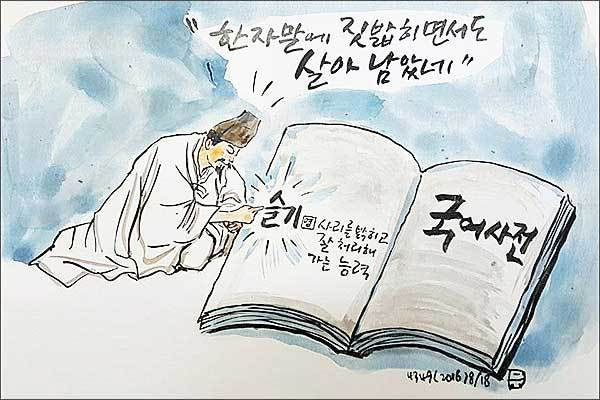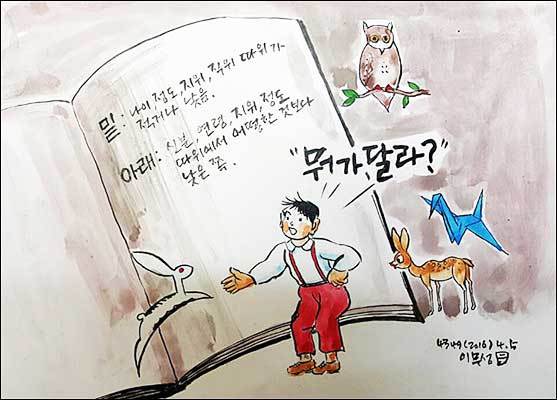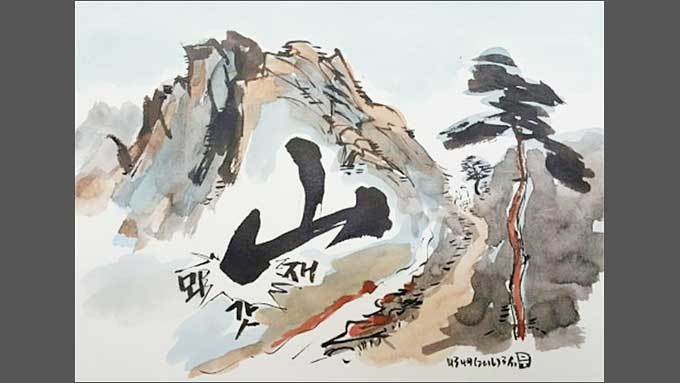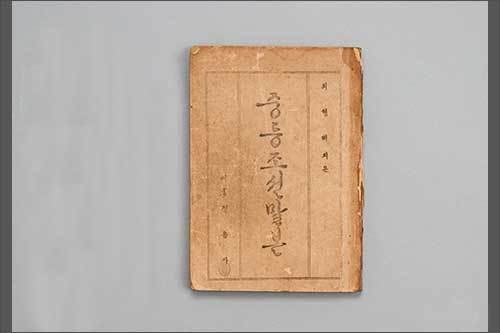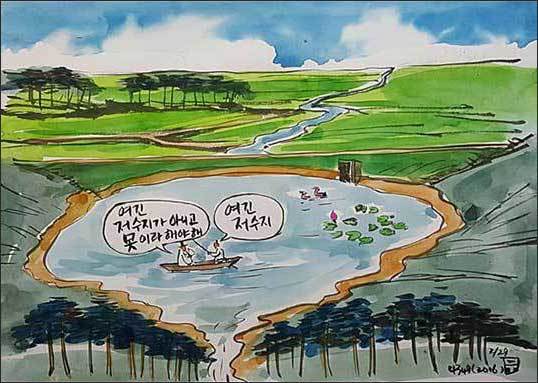오늘 문화일보에는 “강풍타고 번지는 ‘괴물산불’ … 안동 거쳐 청송까지 덮친다.”란 제목의 기사가 올랐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불이 나면 속수무책입니다만 예전에는 건물이 거의 나무로 된 주택이어서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막기 위한 벽사(辟邪)시설을 곳곳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특히 경복궁 근정전 월대 모서리와 창덕궁 대조전, 창경궁 명전전, 덕수궁 중화전, 경희궁 숭정전 등 각 궁궐의 정전(正殿) 앞에 가면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대체로 청동 빛깔을 띤 넓적한 독이 놓여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무엇일까요? 이름하여 ‘‘드므입니다. 이를 어떤 이들은 향로나 쓰레기통으로 잘못 알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화재를 막기 위한 벽사(辟邪)시설이지요. 옛날엔 ‘불’을 관장하고 불을 일으키는 재앙 화마(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