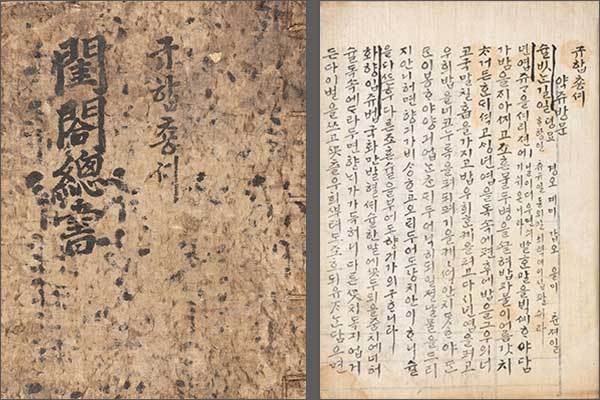성인 여성들 대부분은 한 달에 한 번, 그들만의 피를 보는 작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흔히 성숙한 여성의 자궁에서 약 28일을 주기로 출혈하는 생리 현상 곧 월경(月經)이라고 하는 것인데 월사(月事), 월객(月客)으로도 부르고, 우리말로는 ‘달거리’라고 하며, 빗대어 ‘이슬’, ‘몸엣것’ 등으로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이야 다양한 크기를 갖춘 생리대를 쉽게 살 수 있음은 물론, 각종 모양의 날개가 달린 최첨단 생리대에 음이온이나 한방 처리된 특수 생리대까지 개발돼 그 불편은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 조선시대엔 여성들에게 생리는 부끄럽고, 비밀스러운 것은 물론, 꽁꽁 숨겨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때는 생리대를 ‘개짐’ 또는 ‘서답’이라 하여 하여 주로 광목 옷감을 빨아서 재활용하는 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