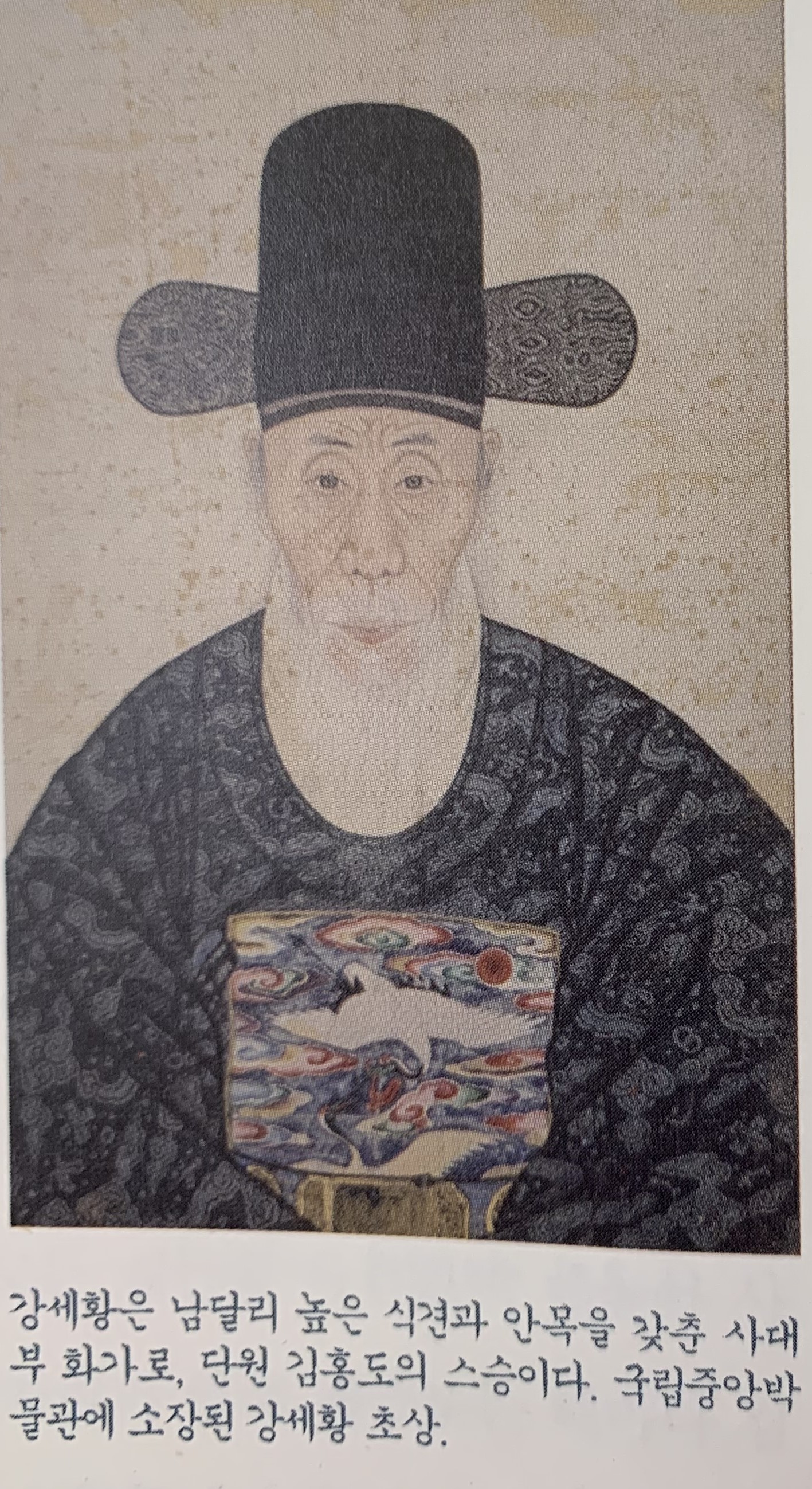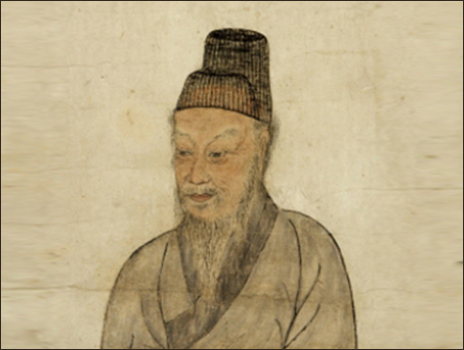호기심 천국 우리 아이들의 자신감이나 학습 호기심은 최하위 수준이다. 어떤 학습법도 호기심을 이기지는 못한다. 과도한 학습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죽이고 우리의 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주범인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초중등 시절의 과도한 학습으로 아이들이 불행하다는 점이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27개국 및 비회원국 15개국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몇 해 동안 가장 불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기숙의《지금 당장 교육을 빅딜하라》중에서 - * '호기심 최하위'. 어둡고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호기심은 미래를 여는 원동력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연료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연료가 없으면 굴러갈 수 없습니다. 4차산업, 인공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