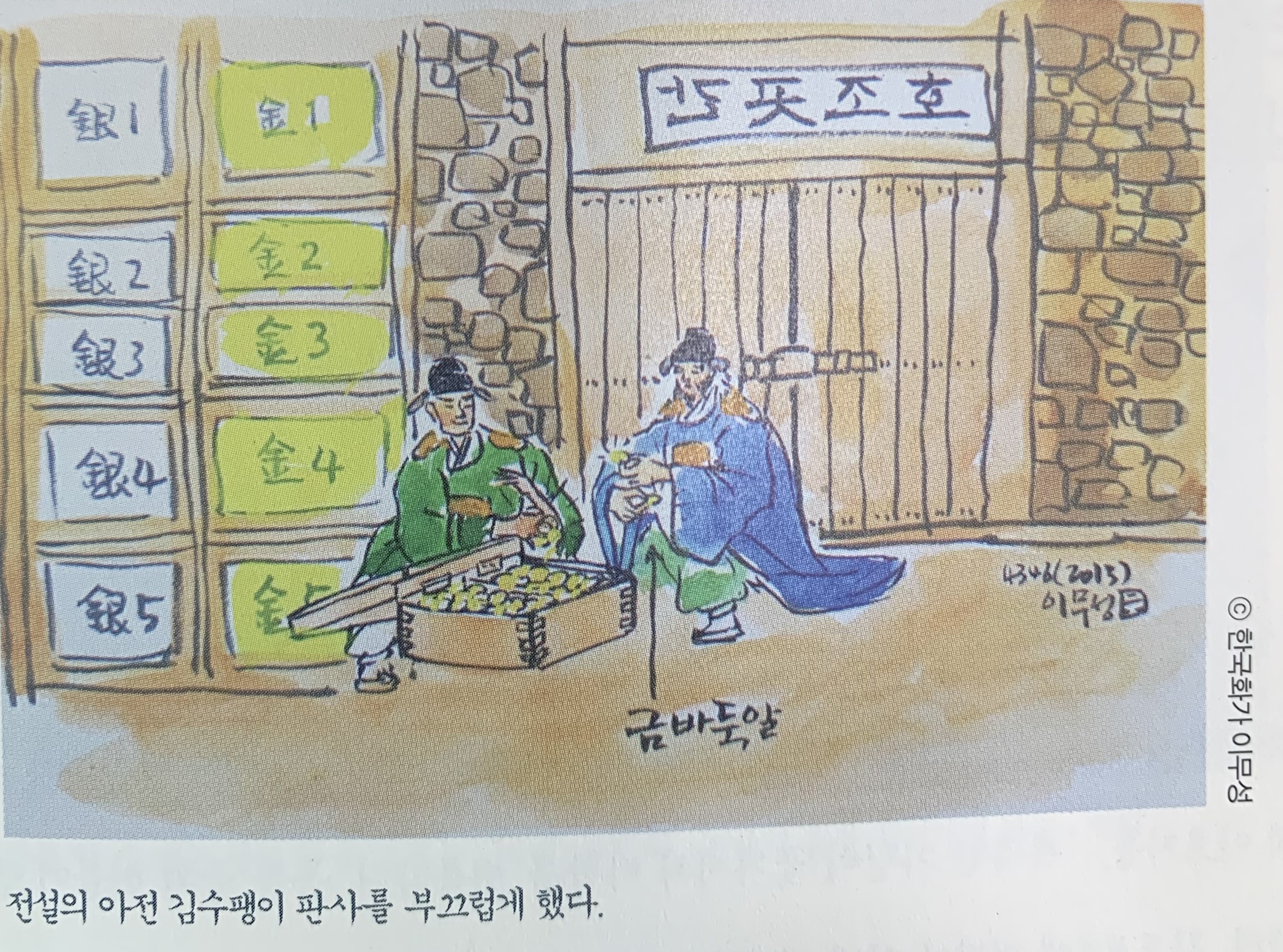항상 웃자 거울을 쳐다보면서 입 양쪽 끝을 힘껏 위로 올리는 연습을 한다. 댄싱을 하거나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웃음 띤 얼굴 모습을 보여 주려 노력하고 있다. 수십 년 전 어느 기도원 정문에 내걸린 표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암은 병이 아니다. 낙심이 병이다. 웃읍시다. 하하하!" 내 좌우명의 첫 번째도 "항상 웃자"이다. "항상 웃자. 모두에게 감사하자. 바보가 되자." - 박태호의《혼자서도 고물고물 잘 놀자》중에서 - * 항상 웃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늘 웃을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웃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로만 웃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밝고 환한 웃음, 그 웃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얼굴의 주름살도 바뀝니다. '항상 웃는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