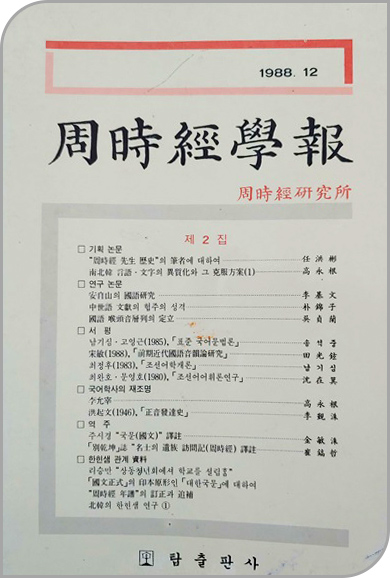‘국문의 어릿광대’ 『국문강의』(1906)의 발문에서 주시경은 “나는 다만 국문의 한 어릿광대 노릇이나 하려는 것이니, 고명하신 분들이 앞으로 말과 글을 연구하고 수정하여 좋은 도구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랬다. 그가 바랐던 것은 그저 ‘국문의 어릿광대’가 되는 것일 뿐이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국문’, ‘고명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더 외면당하던 ‘국문’이 자신의 어릿광대짓으로나마 그분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면, 그리하여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자신은 족하다는 것이었다. ‘국문의 어릿광대 노릇이나 하겠다’는 주시경의 말은 그러나 그저 겸손의 표현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아마 당시에 그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국어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게 될지는 꿈에도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