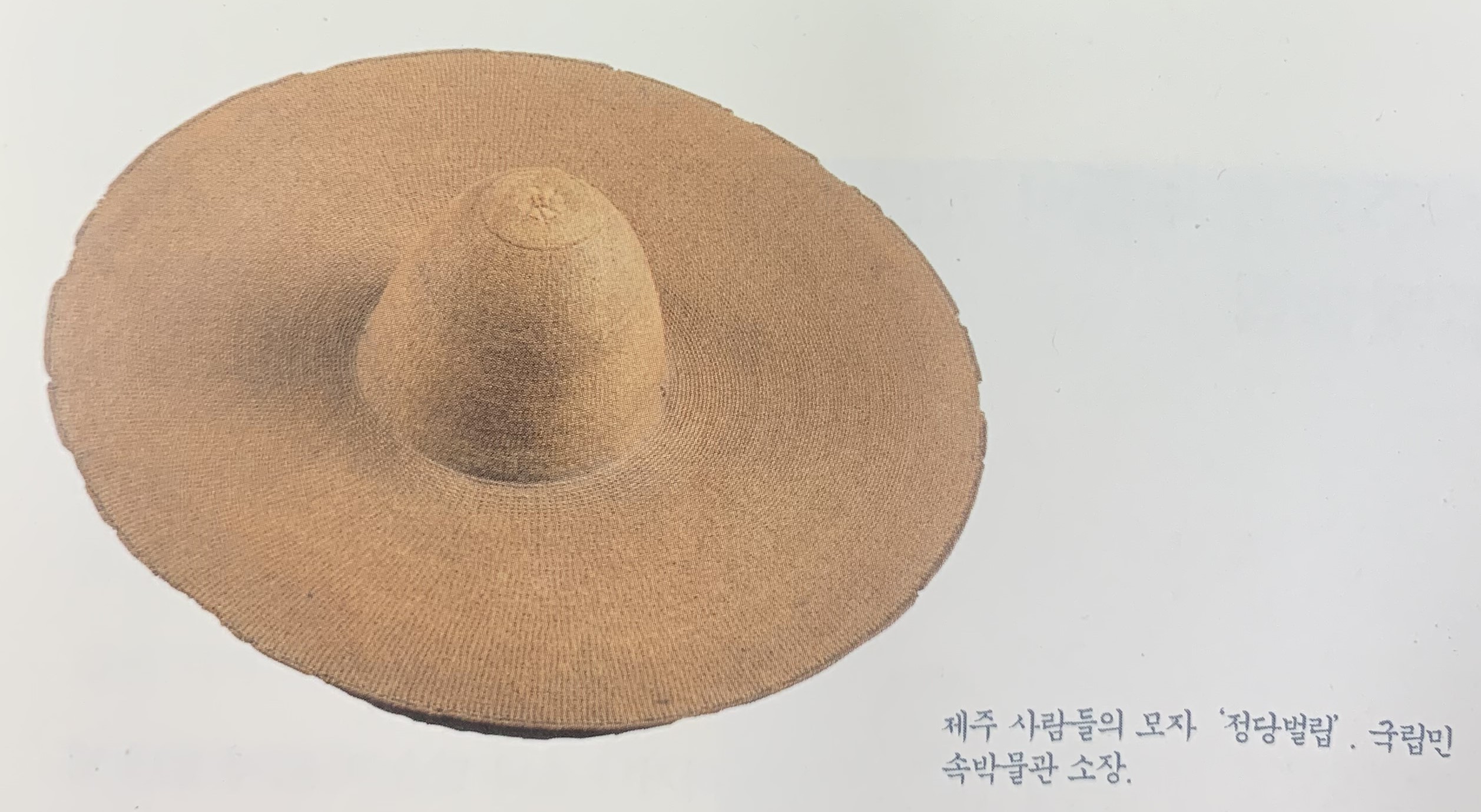漢挐山以下 한라산에서 아래로 흘러松盤奇古節 도사린 소나무는 빼어난 옛날의 절개로南北正方淵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정방연巖謝倒流川 바위에서 물러나 흐르는 시내에 넘어질 듯하네碧海蒼天外 파란 바다는 푸른 하늘 밖에 있고夕照浮雲擁 저녁노을은 떠도는 구름에 에워졌는데青山白雪邊 푸른 산은 흰 눈 가장자리에 있네.西歸昨夜煙 서귀진은 어젯밤 안개에 쌓여있구나 ▲ 이형상의 보물 가운데 ‘정방탐승(正方探勝)’ 이 시조는 1702년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로 부임한 이형상(李衡祥, 1653~1733) 목사가 쓴 정방연(正方淵)」이란 한시입니다. 이형상은 제주에 목사로 부임하여 곳곳을 돌아보고 남긴 중요한 순간들을 1703년 화공(畫工) 김남길(金南吉)에게 그리게 하여 보물 란 화첩을 남겼습니다(국립제주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