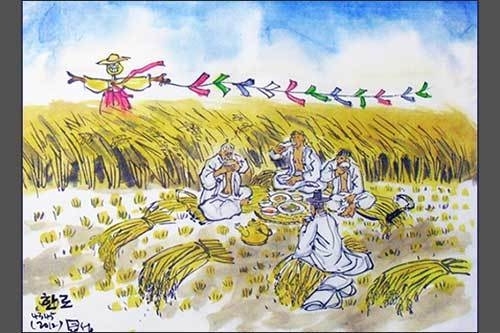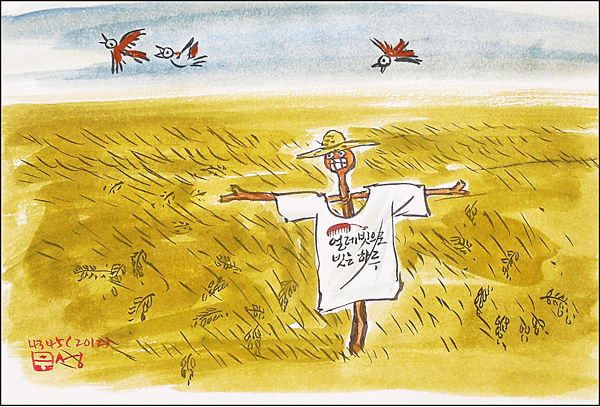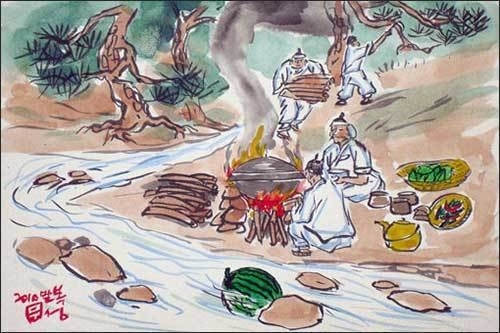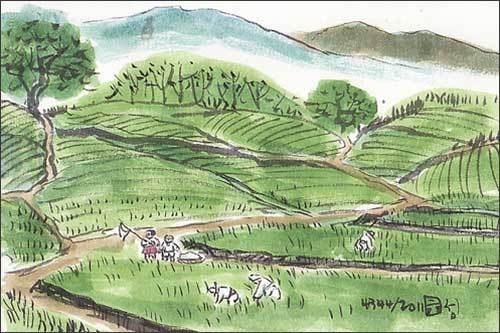오늘은 24절기의 스물두째이며 명절로 지내기도 했던 ‘동지(冬至)’입니다. 민간에서는 동지를 흔히 ‘아세(亞歲)’ 곧 ‘작은설’이라 하였는데 ‘해’의 부활이라는 큰 뜻을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가는 작은설로 대접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해서 ‘동지첨치(冬至添齒)’ 곧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동지는 날씨가 춥고 밤이 길어 호랑이가 교미한다고 하여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동지의 특별한 풍속을 보면 다가오는 새해를 잘 계획하라는 뜻으로 달력을 선물하는데 더위를 잘 견디라는 뜻으로 부채를 선물하는 단오 풍속과 함께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지의 또 다른 풍속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