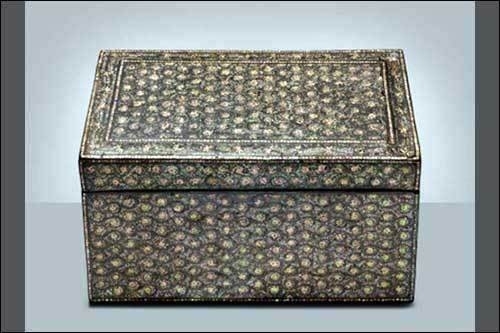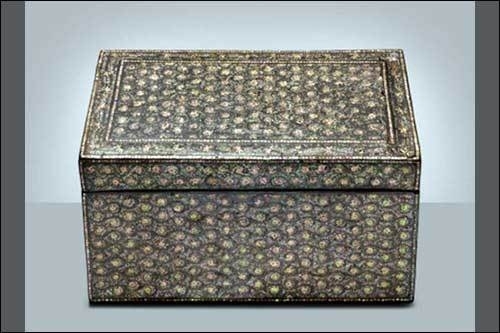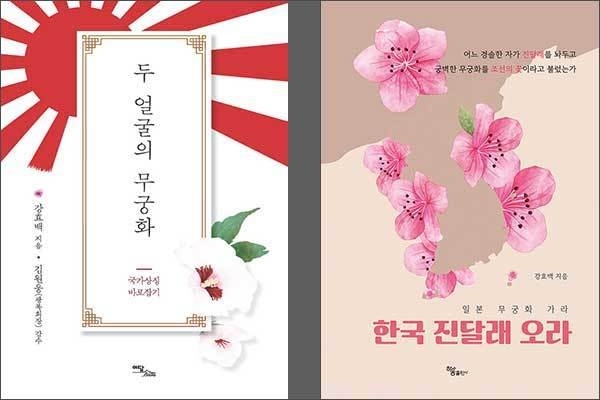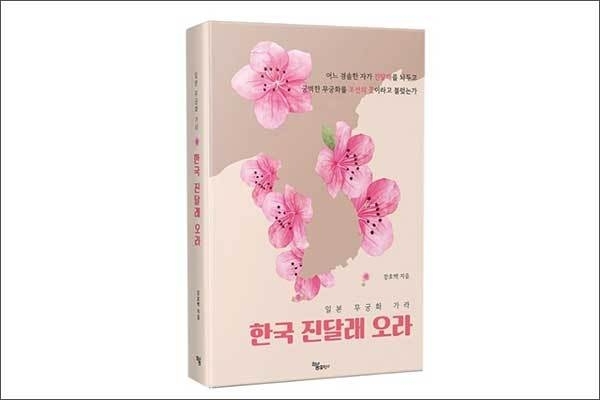오늘(03.20.)은 24절기 넷째 춘분(春分)입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이날 빙실(氷室) 곧 얼음창고의 얼음을 꺼내 쓰기 전에 북방의 신인 현명씨(玄冥氏)에게 “사한제(司寒祭)”라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고려사(高麗史)》 권63 지17 길례(吉禮) 소사(小祀) 사한조(司寒條)에 “고려 의종 때 상정(詳定)한 의식으로 사한단(司寒壇)은 초겨울과 입춘에 얼음을 저장하거나 춘분에 얼음을 꺼낼 때 제사한다.”라는 구절이 보입니다. 춘분 앞뒤로는 많은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2월 바람에 김칫독 깨진다.”라는 속담과 꽃샘추위, 꽃샘바람이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춘분 앞뒤 이레 동안을 “봄의 피안(彼岸)”이라 하여 극락왕생의 때로 보았습니다. 춘분에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농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