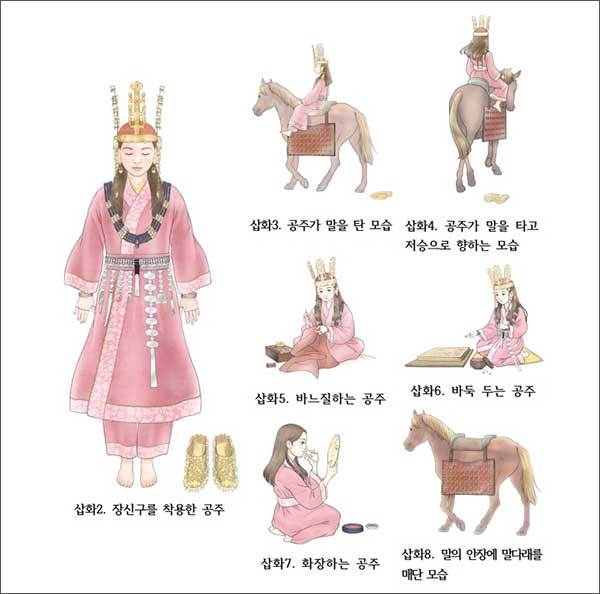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가무형유산 ‘옥장(玉匠)’ 보유자로 김영희(金泳熙, 경기 파주시, 1959년생) 씨를 인정하였다. 국가무형유산 ‘옥장’은 옥으로 여러 가지 기물이나 장신구를 제작하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옥은 동양문화권에서 금ㆍ은과 함께 대표적인 보석으로 여겨지며, 사회신분을 나타내는 꾸미개(장신구)로도 쓰였다. 희고 부드러운 옥의 성질이 끈기와 온유, 은은함, 인내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영희(金泳熙) 씨 옥의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채석-디자인-절단-성형-세부조각(구멍뚫기, 홈파기)-광택의 과정을 거친다. 각 공정에 따라 절단 공구인 쇠톱, 구멍을 뚫는 송곳인 활비비, 연마기인 갈이틀 등의 여러 가지 도구가 사용된다. *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