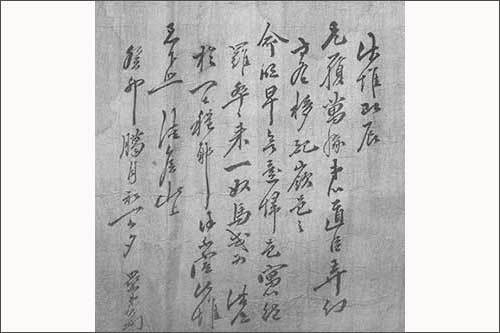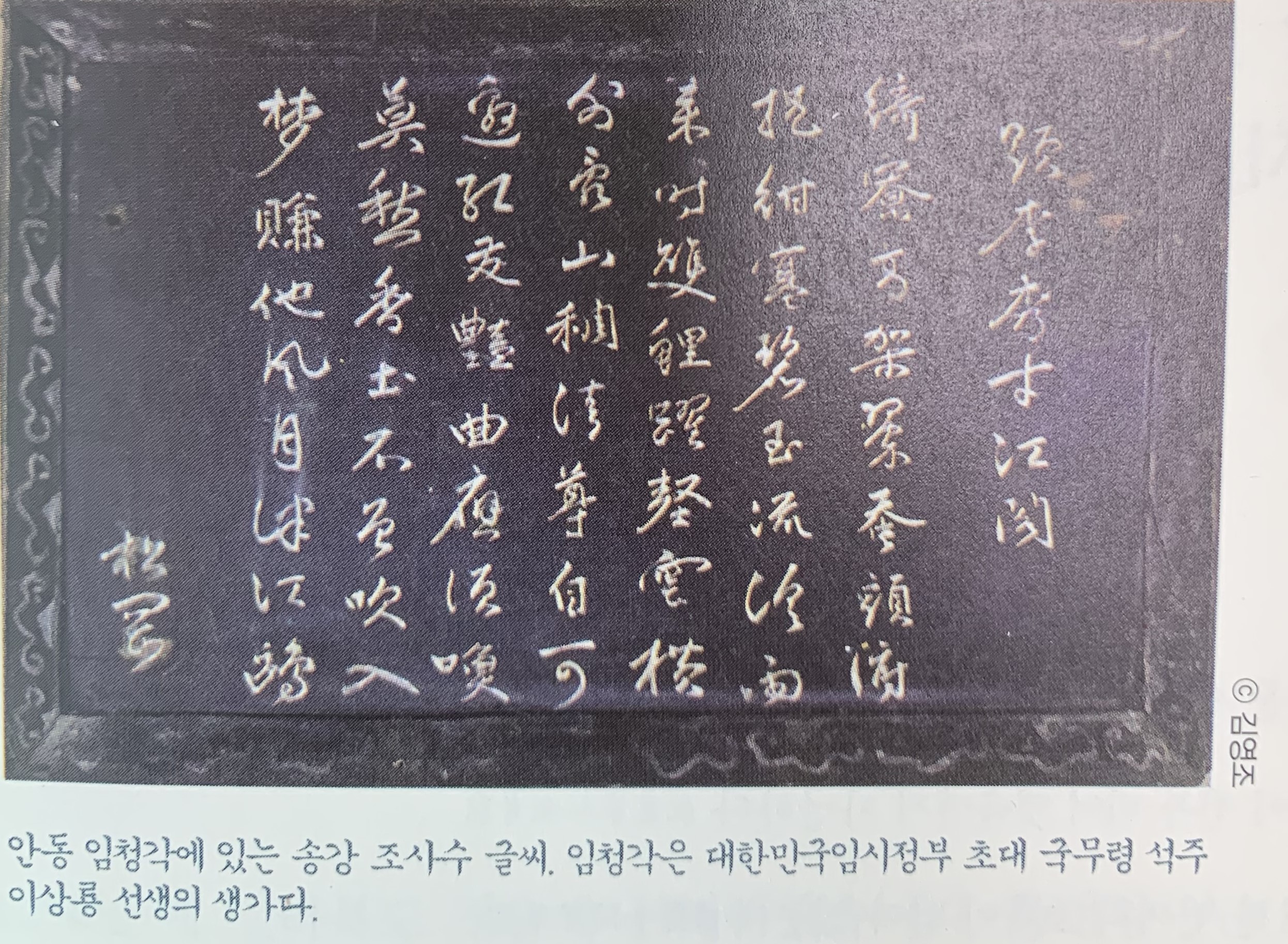전경목이 쓰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가 펴낸 《옛 편지로 읽은 조선사람의 감정》에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알 수 없는 편지 한 장이 있습니다. 원래 편지란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글이지만, 이 편지의 끝에 보면 ‘누제(纍弟)가 이름을 쓰지 않은 체 머리를 조아려 아룁니다.’라고 썼습니다. ‘누제(纍弟)’는 귀양살이하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죄인이기에 자신의 성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 한 유배자가 지인에게 보낸 간찰, 갑자년 12월 1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제공) 또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귀양살이하는 사람이 지인에게 관찰사의 농락으로 유배지를 급하게 옮기게 되었다며, 하룻길을 갈 노비와 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죄수가 교도소에 있을 때나 이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