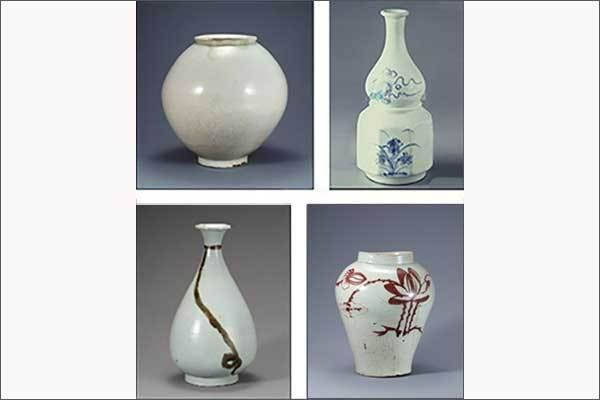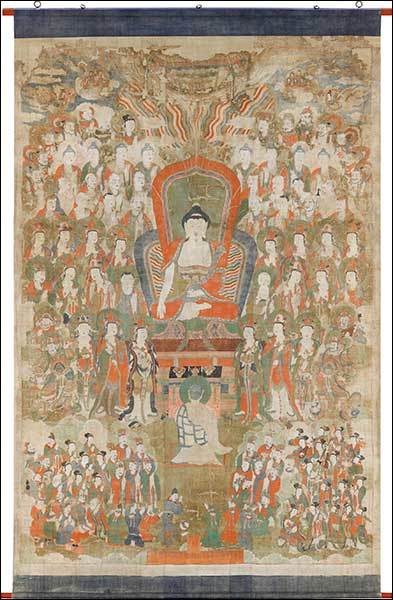국립중앙박물관에는 국보 ‘청동 은입사 물가풍경무늬 정병‘이 있습니다. 정병은 맑은 물을 담아두는 병으로, 원래 승려가 지녀야 할 열여덟 가지 물건 가운데 하나였으나 점차 불전에 바치는 깨끗한 물을 담는 그릇으로 쓰였습니다. 또 불교의식을 할 때 쇄수게(灑水偈, 관음보살을 찬탄하는 소리)를 행하면서 의식을 이끄는 승려가 솔가지로 감로수를 뿌림으로써 모든 마귀와 번뇌를 물리치도록 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 고려시대인 12세기에 만들어진 국보 ’청동 은입사 물가풍경무늬 정병‘, 높이 37.5 cm 정병은 주로 물가의 풍경을 담아냈는데, 언덕 위로 길게 늘어진 버드나무 또는 물 위로 노를 저어가는 어부와 낚시꾼 등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이 모든 풍광이 표면에 홈을 파서 은선을 두드려 박는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