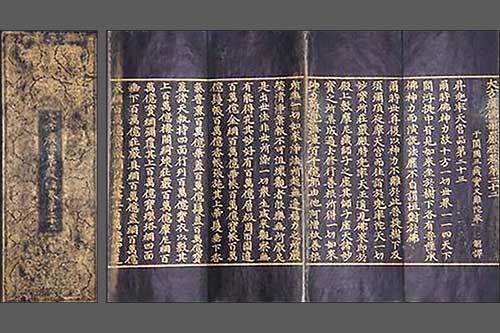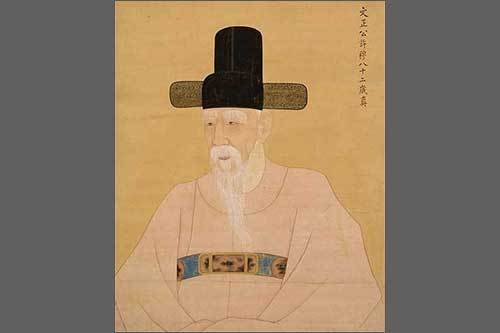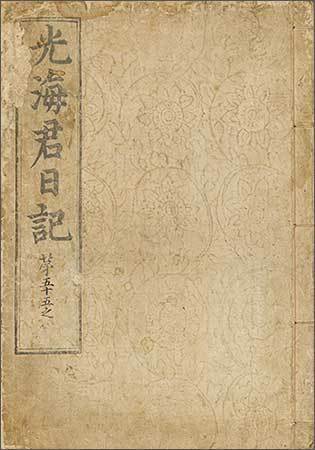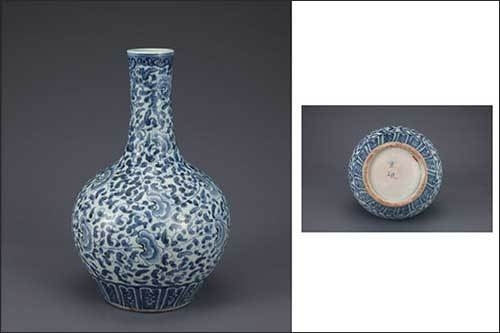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평안북도 운산군 용호동에 있는 고분 3기 가운데 ‘궁녀의 묘’로 전해지는 네모난 돌방무덤에서 출토된 쇠(철)로 만든 부뚜막이 있습니다. 크기는 길이 67.2cm, 높이 29.1cm, 너비 23cm입니다. 긴 네모꼴 한쪽에 아궁이와 솥 구멍을 마련하고, 반대쪽에 굴뚝을 붙인 모양이지요. 아궁이와 굴뚝을 옆으로 나란히 배치한 점이 특징으로 이마에는 불꽃모양 무늬가 있습니다. 휴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로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쇠로 만든 부뚜막, 평안북도 운산면 동신면 용호동 제1호분 출토(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여기서 ‘부뚜막’이란 것은 아궁이 위 가마솥이 놓인 언저리에 흙과 돌을 쌓아 편평하게 만들어, 솥에서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을 두거나 간단한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