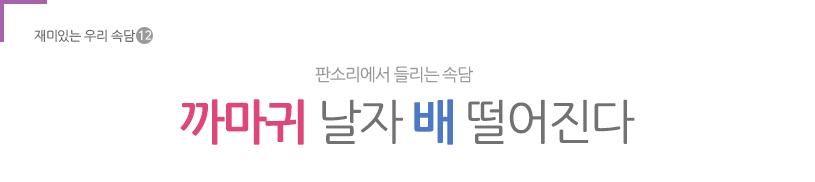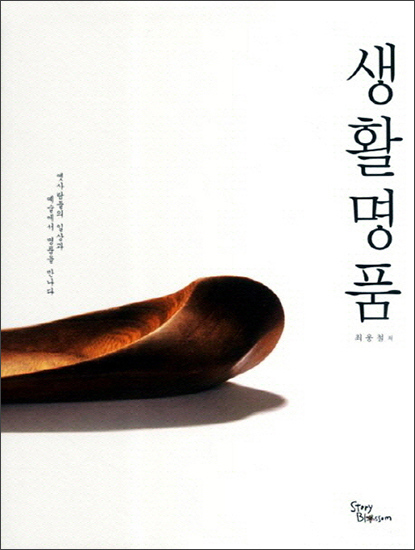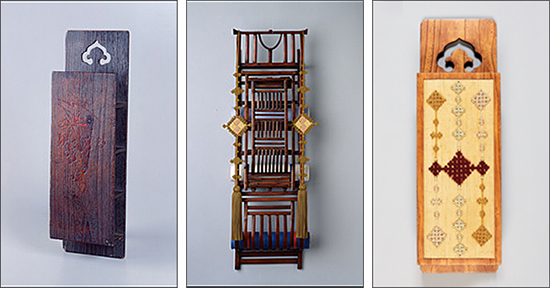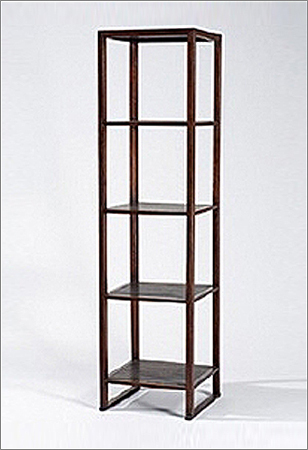속담은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내용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과정을 통해 갈무리된, 공동체적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 연행되거나 전승되는 모든 종류의 텍스트에 속담이 쉽게 끼어 들어 가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판소리’가 있지요. 판소리는 양반가의 사랑방에서 향유되기도 하고 라디오나 레코드판에 실려 전승되기도 했지만, 연행과 전승의 핵심은 거리의 판놀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숱한 말과 노래와 이야기들이 광대들의 사설 엮음을 통해 판소리로 흘러들기도 하고 판소리의 유명한 대목이나 흥미로운 표현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다시 시정의 일상 문화 속으로 스며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판소리에는 일상적인 말의 문화가 남긴 흔적으로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