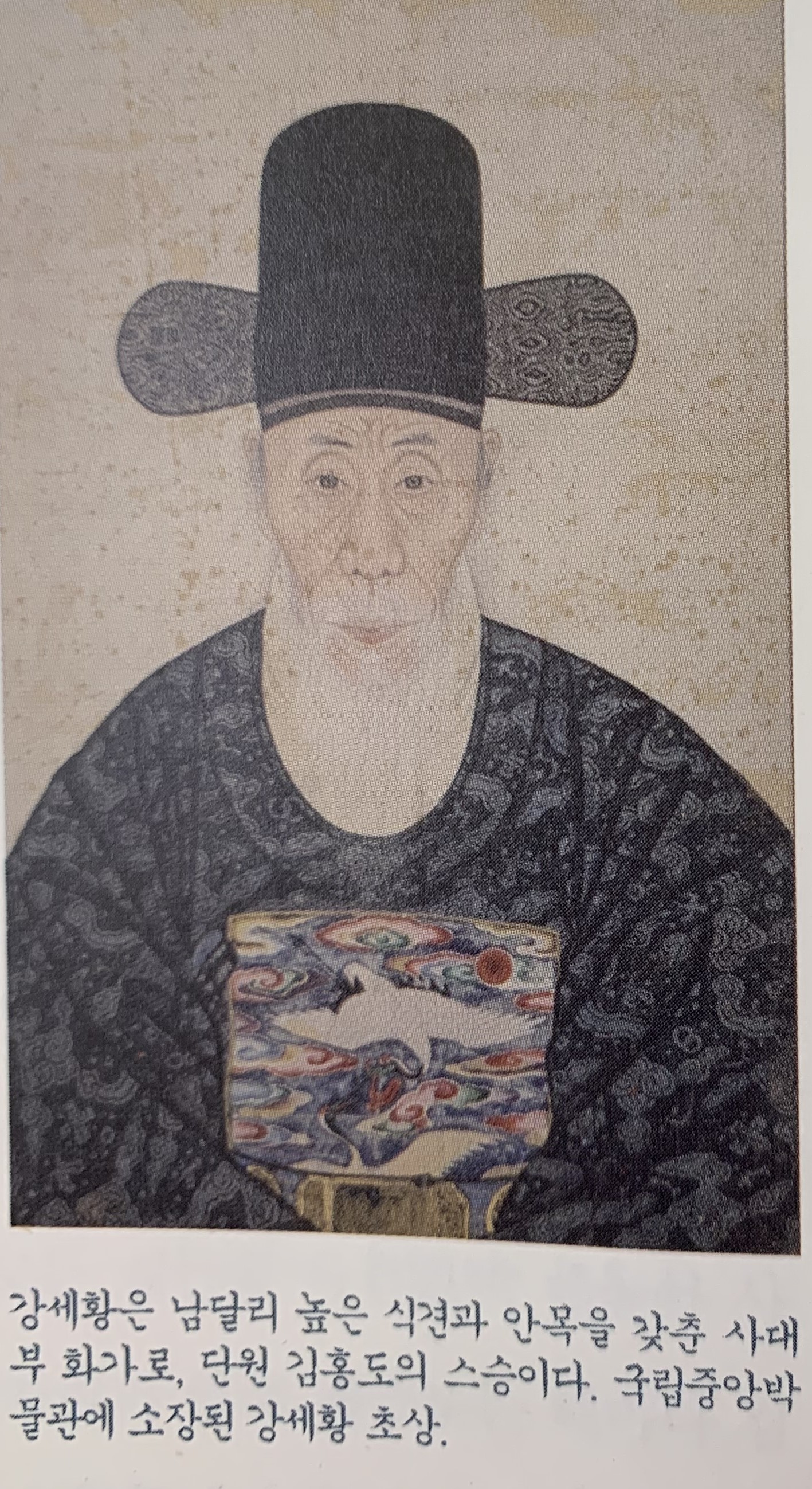궁중장식화, 상징과 염원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유재빈 (홍익대학교) 1. 궁중장식화란 무엇인가 – 개념 궁중장식화는 궁궐 공간을 장식하기 위해 사용된 그림을 의미한다. 내용상 길상적인 소재가 많고 표현이 관습적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에 민화와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궁중장식화는 오랫동안 민화의 범주에서 연구되거나 전시되었다.1) 그러나 왕실에서 사용되던 궁중 회화를 민화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식이 일면서 1990년대부터 궁중에서 사용된 것이 분명한 유물, 특히 일월오봉도와 모란도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2) 궁중 회화가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인식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궁중장식화 가 민화의 일환으로 다루어졌듯이 궁중 행사도는 풍속화의 범주에서, 궁궐도는 산수화의 범주에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