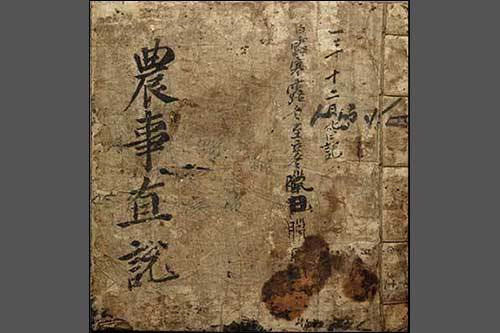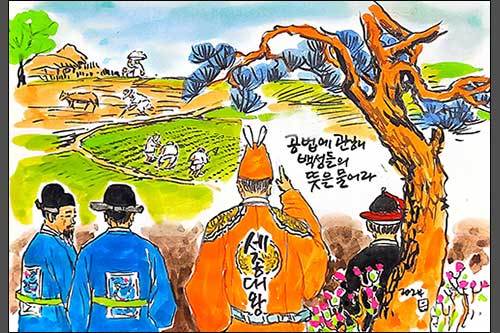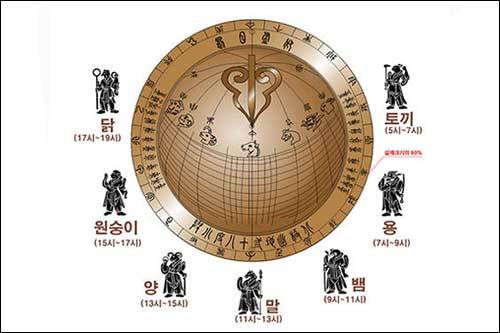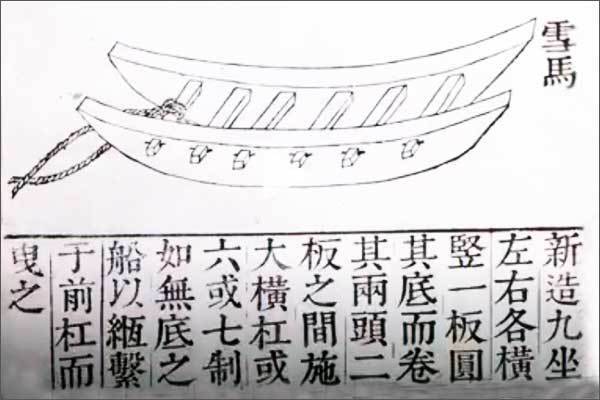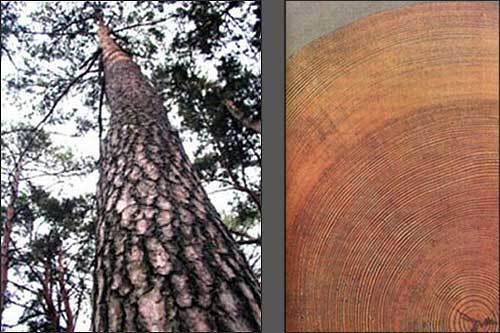"홍역을 물리치기 위한 제사는 비록 과거의 사례가 없으나, 먼저 해조가 대략 을미년의 규칙을 모방하여 ‘여제(厲祭)’를 지내기 하루 이틀 전에 날을 가려 향(香)을 받게 하라. 비록 차례가 아니라도 먼저 성황(城隍)에 고하는 것은 본래 응당 행해야 할 법이니, 발고제(發告祭, 조상에게 고하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각부(各部)의 중앙에서 여제를 지내되, 지방 고을에도 모두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이는 《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1786년) 4월 10일 기록입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코로나 돌림병이 번져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돌림병이 돌면 온 세계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난리가 납니다. 하물며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조선시대는 제사를 지내 줄 자손이 없거나 원통하게 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