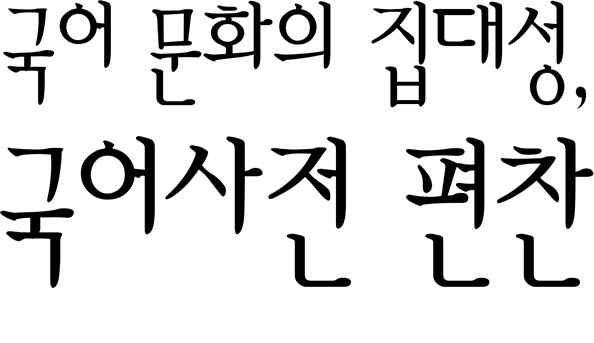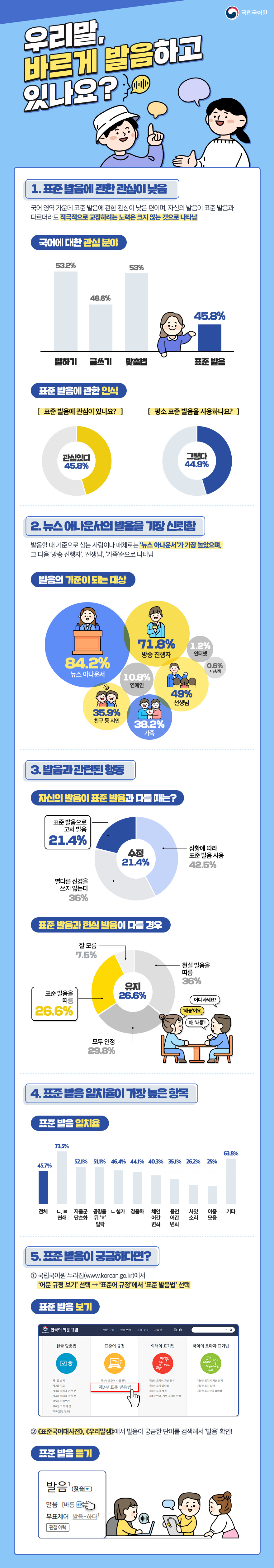국립국어원에서 국어사전 운영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거의 매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누리소통망 등에서 ‘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을 검색해본다. 사람들이 어떨 때 ‘국어사전’이란 것에 관심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보통 단어의 표기나 뜻풀이가 궁금할 때 사전을 찾아본다. 이렇게 사전에서 직접 단어를 검색하는 것 말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떨 때 ‘사전’을 언급하게 될까? ‘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과 같은 말을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사전 내용을 자신이 하려는 말의 근거로 삼는 경우이다. ‘사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으니, 이러저러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많다. 국어사전을 인용한 결과를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