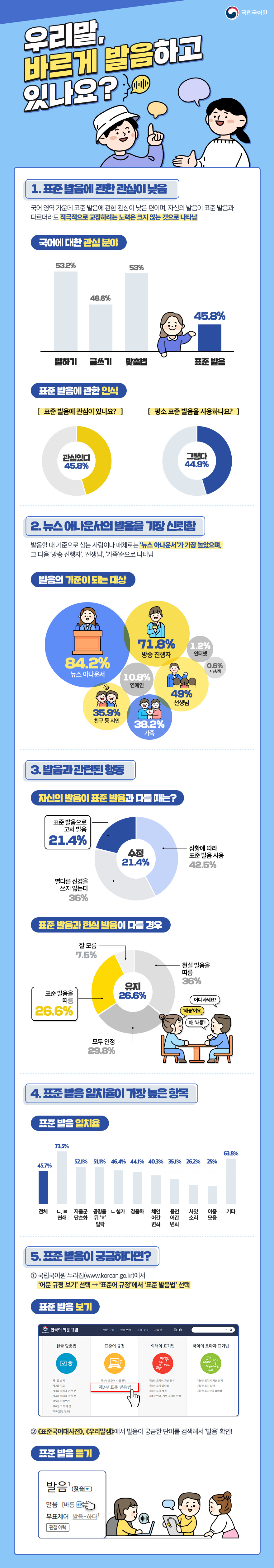글을 읽고 쓰다가 뜻을 잘 모르거나 맞춤법이 헷갈릴 때 찾아보는 것이 국어사전이다.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찾든 나오는 검색 결과는 ‘국어사전’ 및 기타 사전의 내용이다. 이처럼 사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알게 모르게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의외로 사전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전에는 맞춤법이나 뜻뿐 아니라 그 단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매우 풍부하게 담겨 있다. 따라서 사전을 제대로 안다면 두 배, 세 배, 그 이상으로 즐길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이러한 국어사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9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을 종이사전으로 발간한 후 현재는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고, 2016년에는 온라인 사전인 “우리말샘”을 개통하였다. 앞으로 이 두 사전의 특징,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