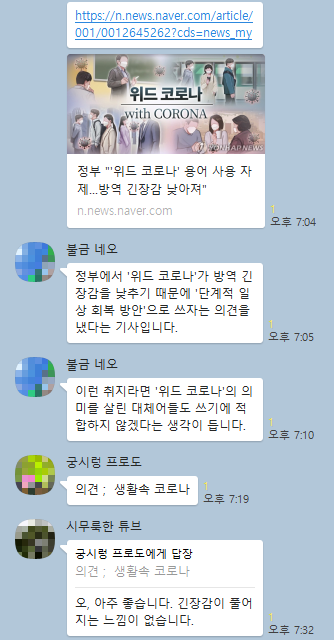흔히 기운이 가득하면 ‘기운차다’라 하고 어떤 일의 결과가 몹시 좋으면 ‘보람차다’고 말한다. 또 아주 옹골지면 ‘옹골차다’라 하고 희망이 가득한 것을 ‘희망차다’라 표현한다. 이처럼 우리말에 ‘차다’가 붙으면 그 말의 뜻을 한층 보태주거나 강조하는 구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다’는 얼마든지 많은 말들에 붙어 쓰일 수 있다. 가령, 매우 능글맞다는 뜻을 나타내고 싶으면 ‘능글차다’고 말하면 되고, 성깔이 보통이 넘으면 ‘성깔차다’라고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몹시 자랑스러울 땐 ‘자랑차다’라고 하면 된다. ‘능글차다’, ‘성깔차다’, ‘자랑차다’ 같은 말들은 모두 국어사전에도 실려 있는 표준말이고, 이런 말들을 자주 활용해서 쓰는 것이 우리말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차다’를 붙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