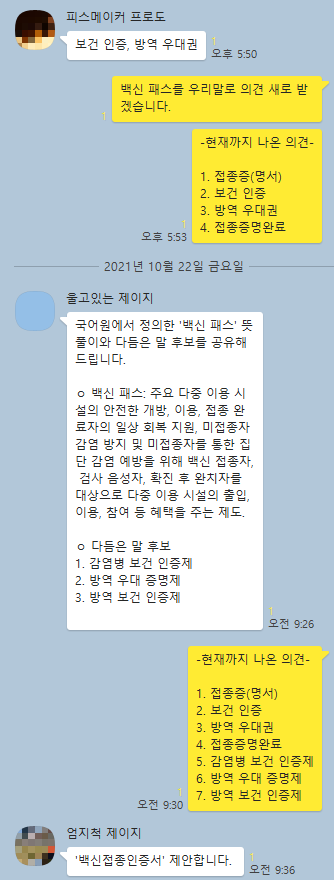‘알갱이’와 ‘알맹이’란 서로 다른 두 낱말이 있는데, 그 각각의 쓰임을 잘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알갱이’는 “곡식의 낟알이나, 열매의 낱개”를 가리키는 말이다. “쌀이나 보리, 밀 알갱이는 잘고, 도토리나 밤 알갱이는 굵다.”처럼 쓰인다. 반면에 ‘알맹이’는 “물건을 싸고 있는 껍데기나 껍질을 벗기고 남은 속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땅콩을 까서 알맹이를 모아 놓은 것보다 남은 껍데기가 더 수북하다.”처럼 쓰인다. ‘알갱이’는 셈을 헤아리는 단위로도 쓰여서 “한 알갱이, 두 알갱이, 세 알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알맹이’는 그렇게는 쓰이지 않는다. 모처럼 하늘이 높고 햇살이 눈부신 나날이다. 이런 날씨가 보름만 지속되어도 올 가을 수확이 풍성해질 것이다. 벼베기를 한 뒤에 이삭을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