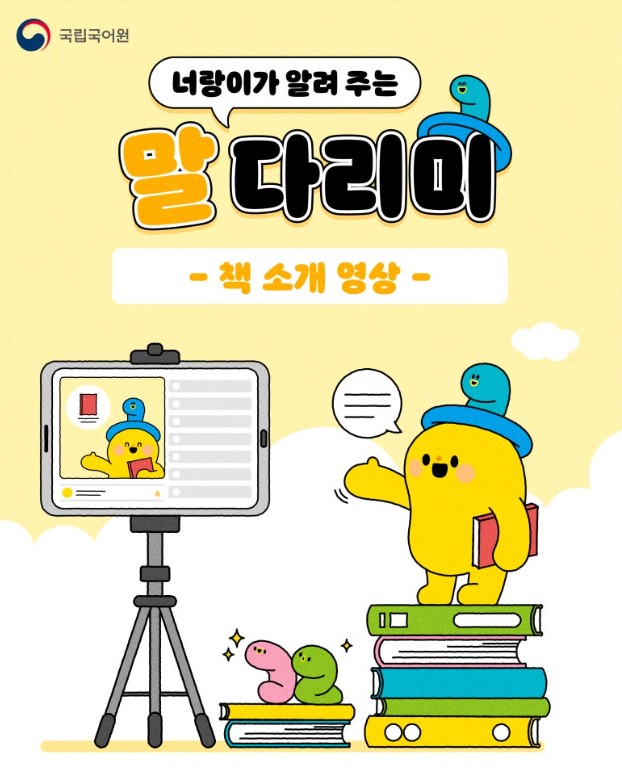국립중앙도서관, 『동국이상국전집』 등 3종 보물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김희섭)은 국가유산청이 『동국이상국전집』(4책), 『대방광불화엄경소』(1첩), 『삼봉선생집』(1책)의 역사적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하고 이를 4월 24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은 『동의보감』 등 국보 2종, 『석보상절』 등 보물 14종이 됐다. ▲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8 표지(왼쪽), 《삼봉선생집》 권7 첫면 『동국이상국전집』은 고려 문인 이규보(李奎報, 1169~1241)의 시문집으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에 관한 내용과 고구려의 건국 신화를 웅장하게 서술한「동명왕편(東明王篇)」을 수록하고 있다. 1241년 아들 이함(李涵)이 초간본을 편집·간행하였으나 오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