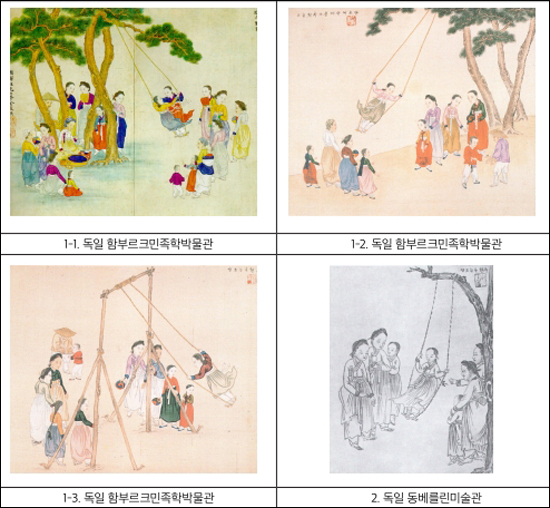“처음에 임금이 주야 측후기(晝夜測候器, 밤낮으로 기상의 상태를 알기 위해 천문의 이동이나 천기의 변화를 관측하는 기기)를 만들기를 명하여 이름을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라 하였는데, 이를 완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모두 네 벌인데, 하나는 궁궐 안에 둔 것으로 구름과 용으로 장식하였으며, 나머지 셋은 발이 있어 바퀴자루[輪柄]를 받고 기둥을 세워 정극환(定極環, 별의 운동을 관측하는 기구)을 받들게 하였다. 하나는 서운관(書雲觀)에 주어 점후(占候, 구름의 모양ㆍ빛ㆍ움직임 등을 보고 길흉을 보는 점)에 쓰게 하고, 둘은 함길ㆍ평안 두 도의 절제사 영에 나눠주어 경비하는 일에 쓰게 하였다.” ▲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복원품, 53×164.5cm, 국립민속박물관 이는 《세종실록》 19년(143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