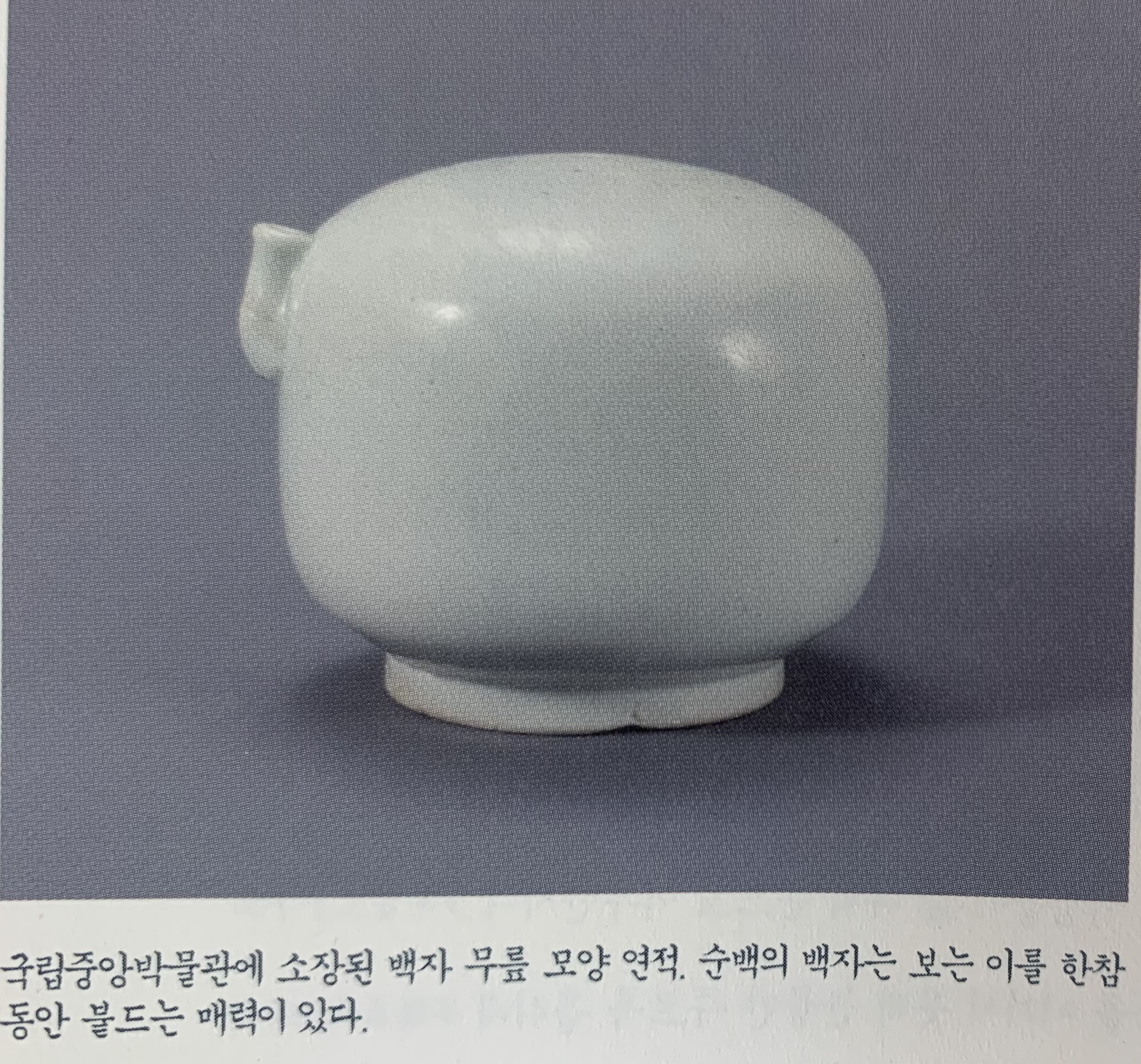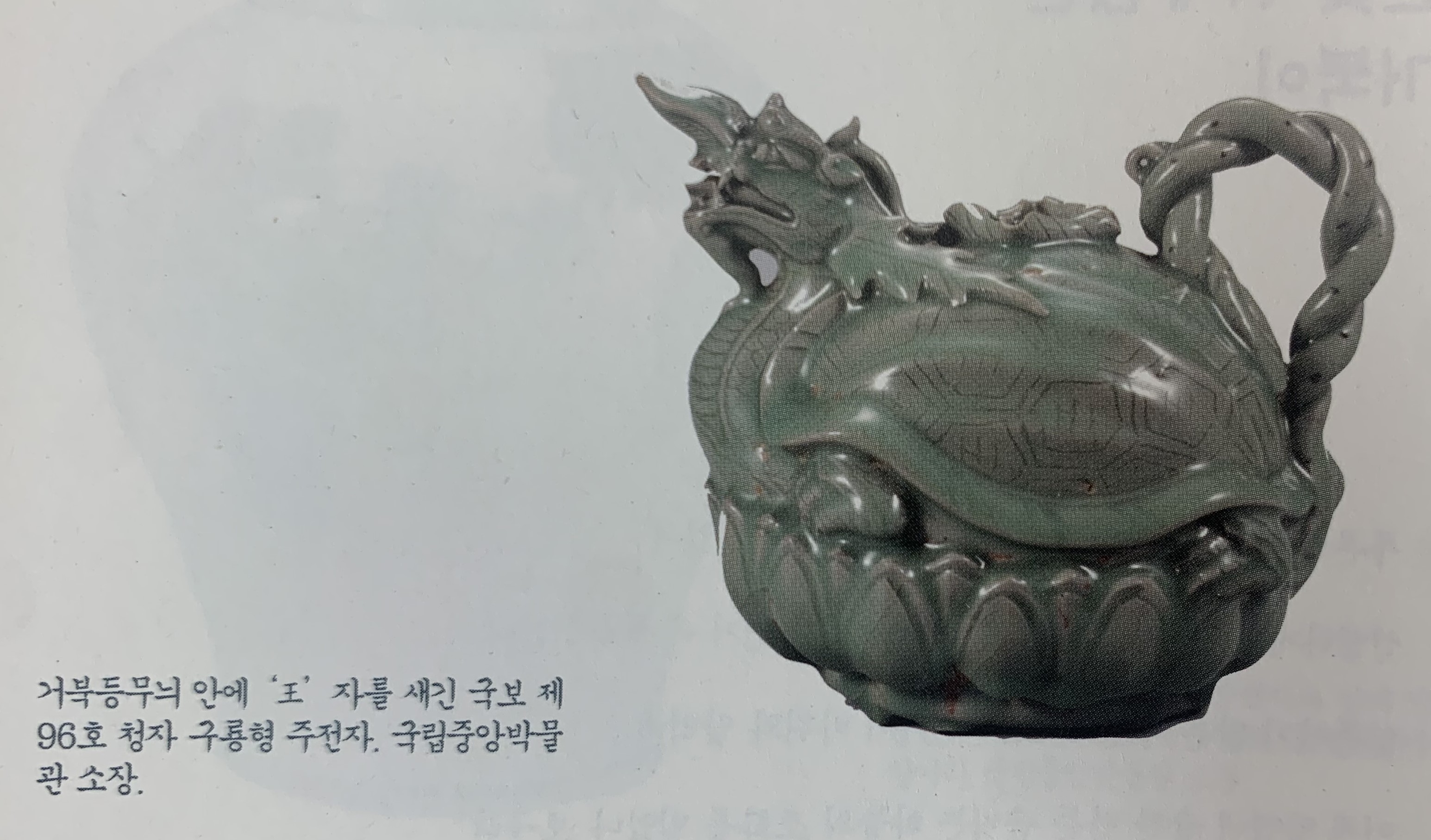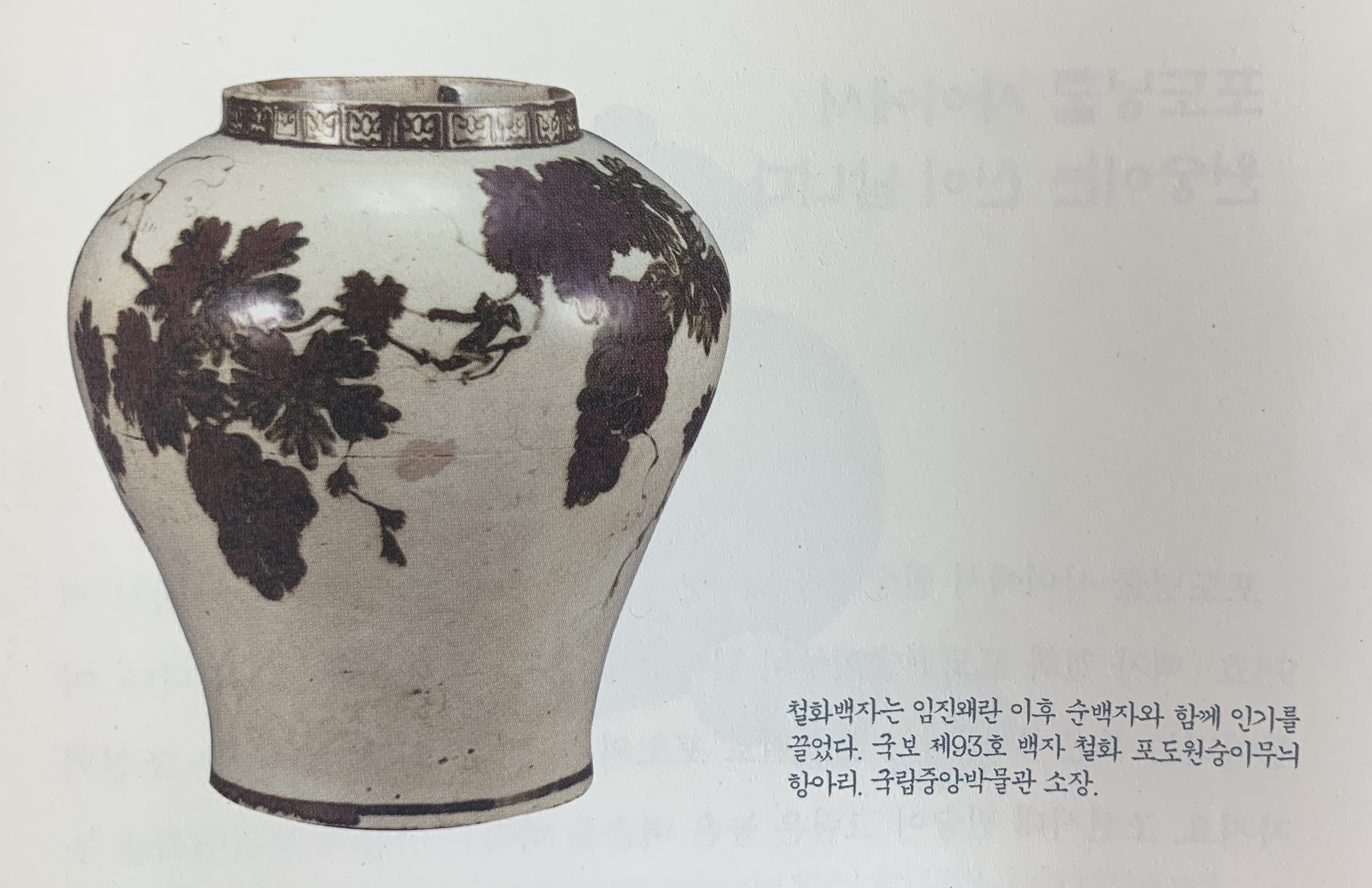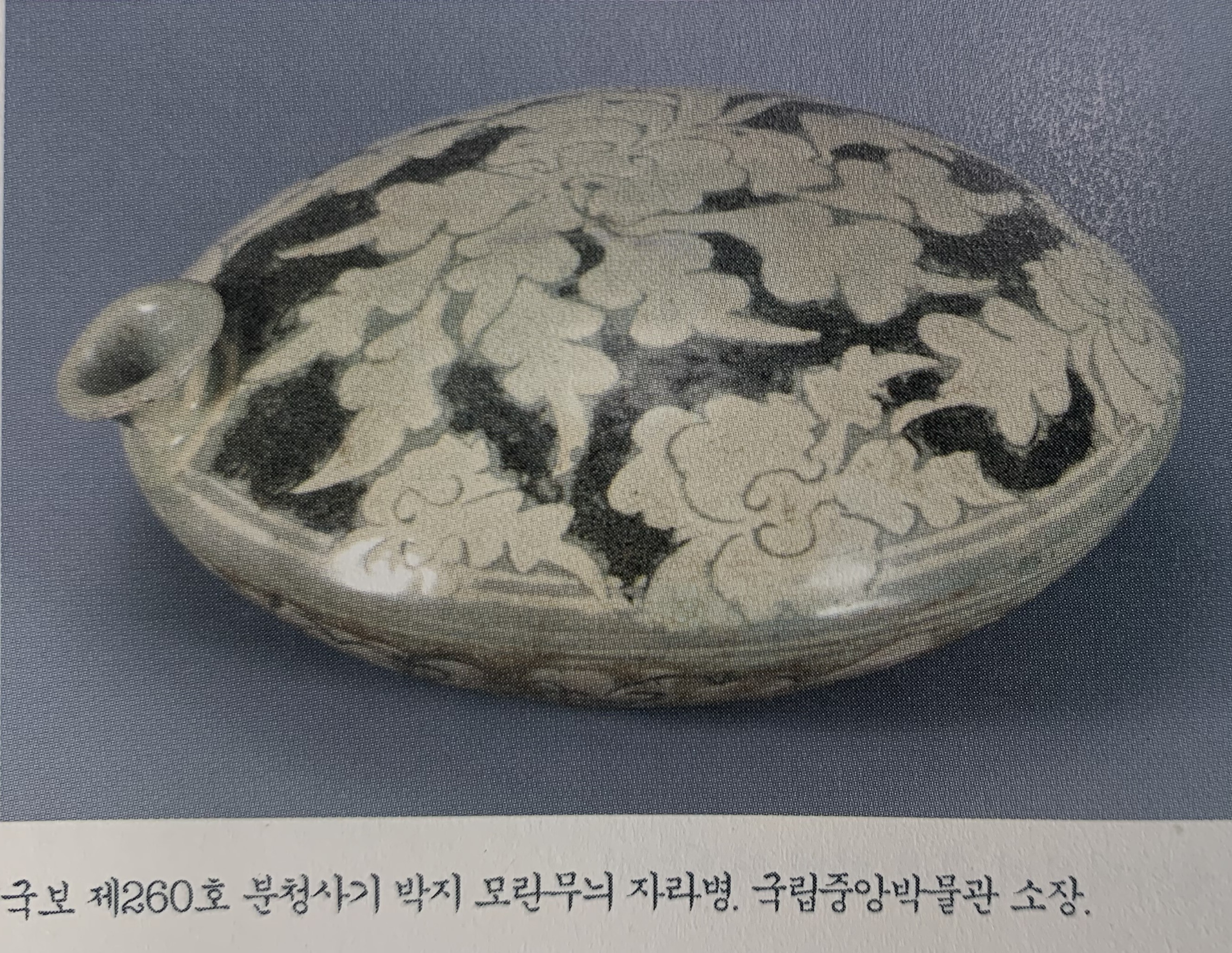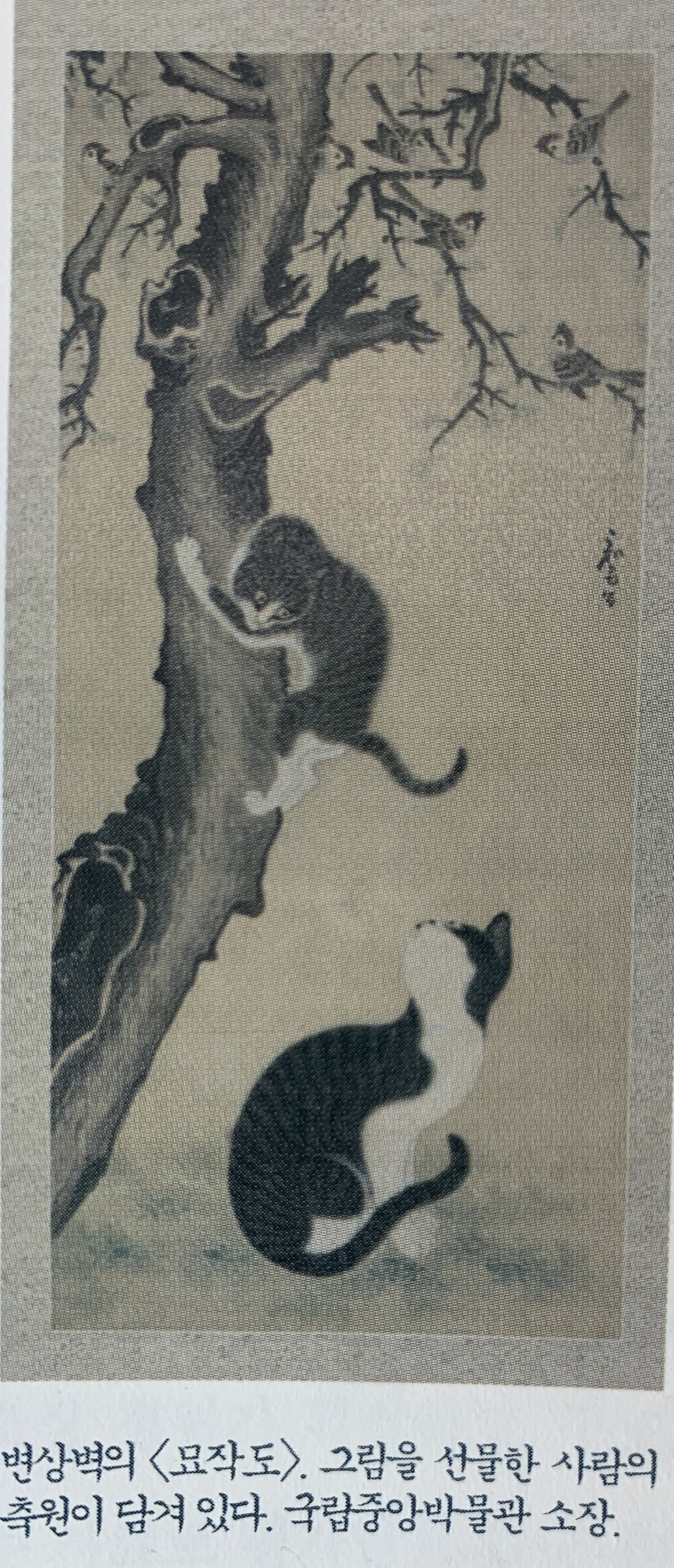일본 고류사 미륵상, 일본인의 얼굴 지그시 감은 눈과 입가에 감도는 미소를 보면 그것은 바야흐로 법열法悅을 느끼는 듯 성스럽고 신비스러워 보인다. 아! 어쩌면 저렇게도 평온한 모습일 수 있을까. 몸에 어떤 장식도 가하지 않은 나신裸身이다. 우리의 국보 83호 금동미륵반가상만 해도 목덜미에 둥근 옷주름을 표현해서 법의法衣가 몸에 밀착돼 있음을 암시하지만 이 불상에선 가슴 부분이 가벼운 볼륨감으로 드러나 있고 목에 세 가닥 목주름을 나타냈을 뿐이다. 이를 삼도三道라 한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 3: 교토의 역사』에 나오는 일본 교토 고류사廣隆寺의 ‘목조미륵반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술사를 전공한 저자는 참으로 섬세하게도 미륵상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류사 미륵상에 엄청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