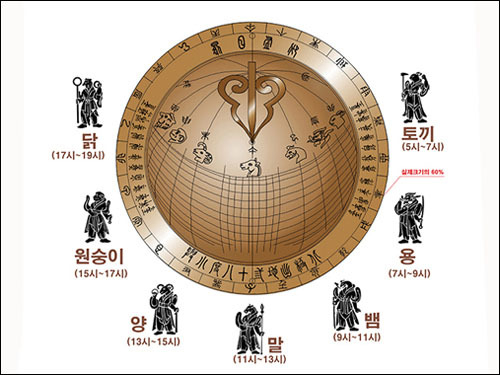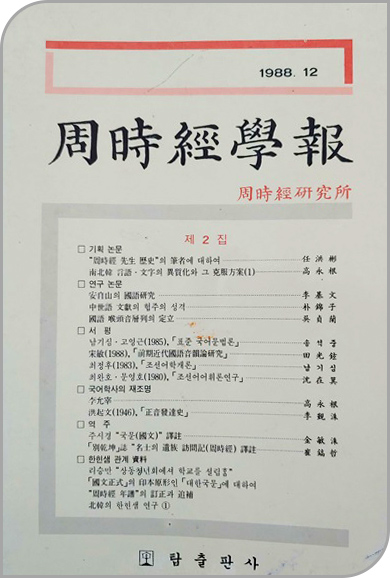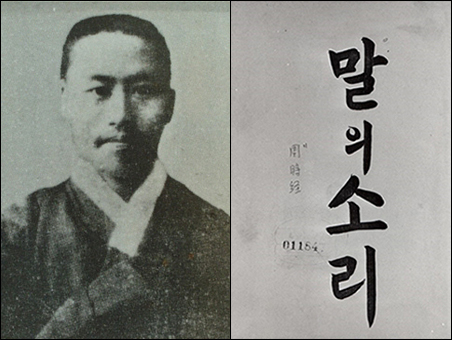지난 6월 29일 문화재청은 서울 종로구 공평동 유적에서 항아리에 담긴 조선 전기에 만든 금속활자 1,600여 점이 발굴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금속활자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표기가 반영된 가장 이른 시기의 한글 금속활자’입니다. 이번에 출토된 금속활자들은 조선 전기 다종다양한 활자가 한 곳에서 출토된 첫 발굴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지요. ▲ 〈한글 금속활자〉, 대자(大字), 가로 1.5cm, 세로 1.2cm, 높이 0.7cm 특히, 이 활자는 지금까지 전해진 가장 이른 조선 금속활자인 세조 ‘을해자(1455년)’보다 20년 이른 세종 ‘갑인자(1434년)’로 추정되는 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종 ‘갑인자’는 세종 당시 천문기계를 제작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