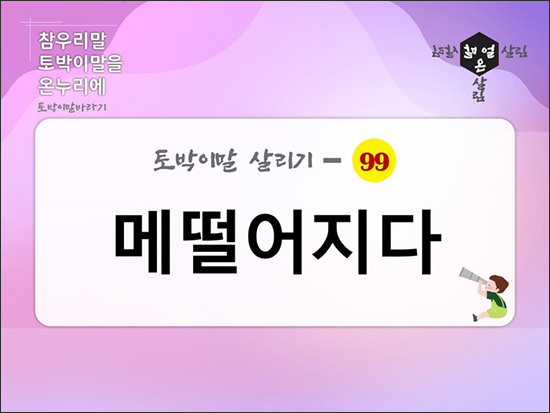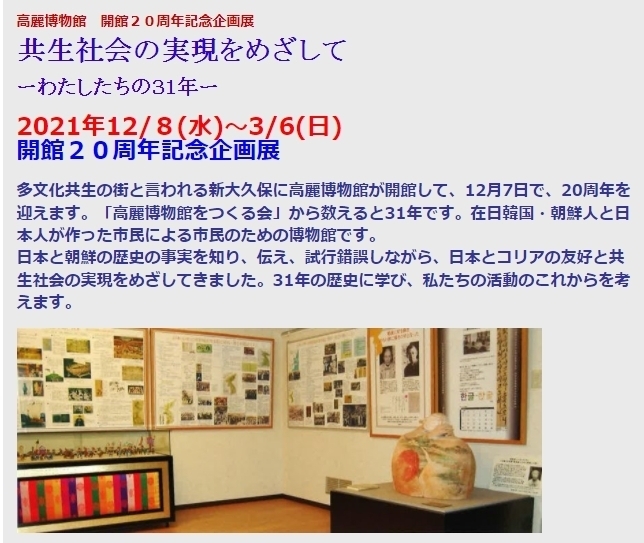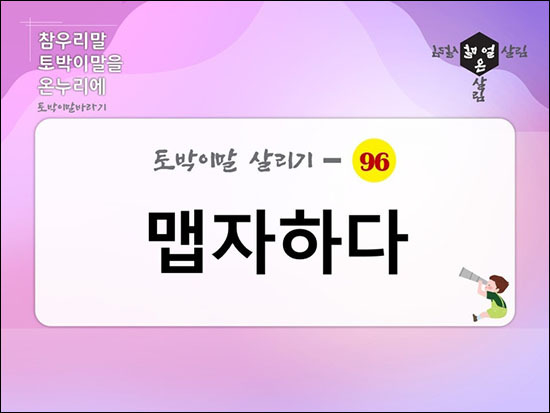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청자상감국화모란문과형병, 연가7년명금동여래입상. 우리나라 문화재 이름은 참 어렵다. 모두 한자로 되어있어 어지간한 어른도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저 밑줄 좍좍 그으며 외우기만 했지, 문화재 이름이 왜 그렇게 불리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탓이다. 그래서 길라잡이가 필요하다. 한자어로 된 문화재 이름을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역사는 재미없는 암기과목’으로 억울한 낙인이 찍히는 일도 뚜렷이 줄었으리라. 사실 그 뜻을 이해하고 나면, 문화재가 걸어온 길과 지금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더는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반가사유상 두 점, 국보 78호와 국보 83호만 해도 그렇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들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