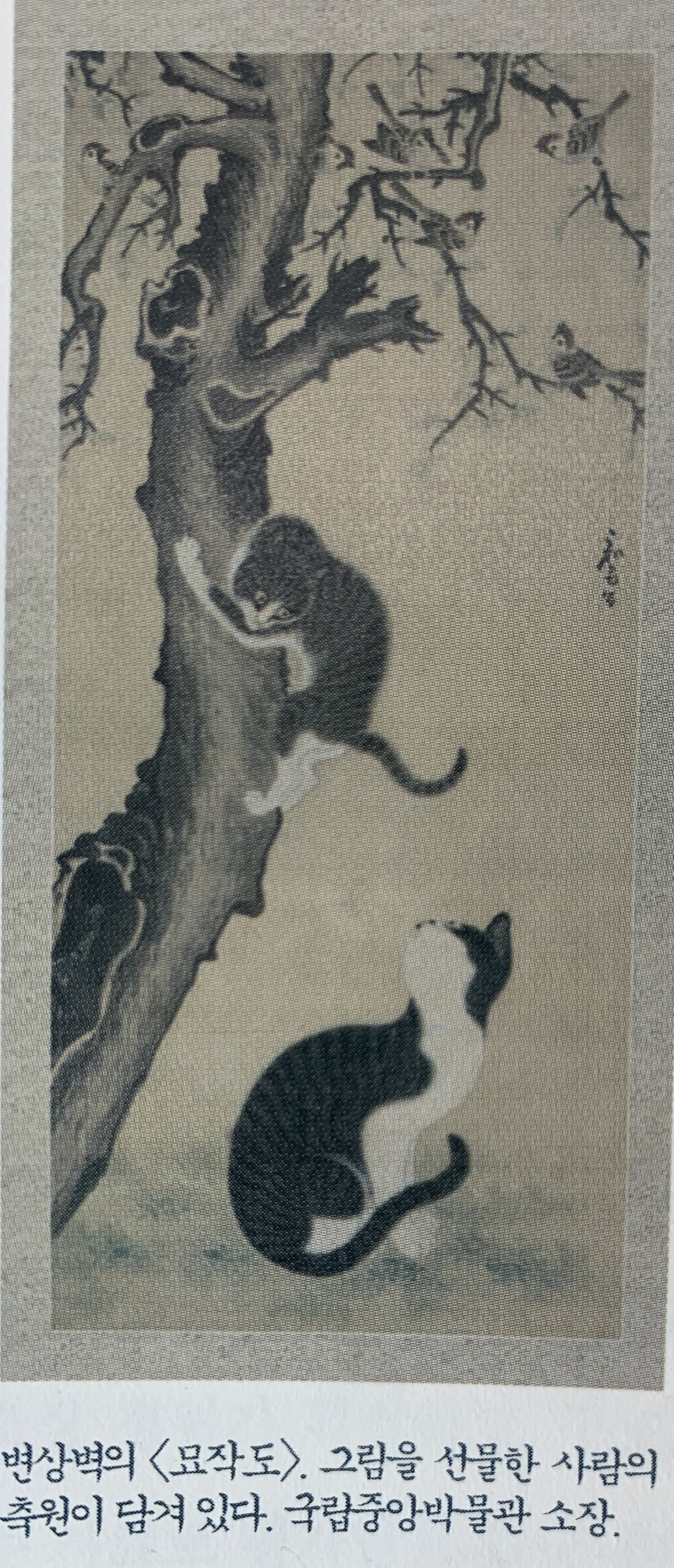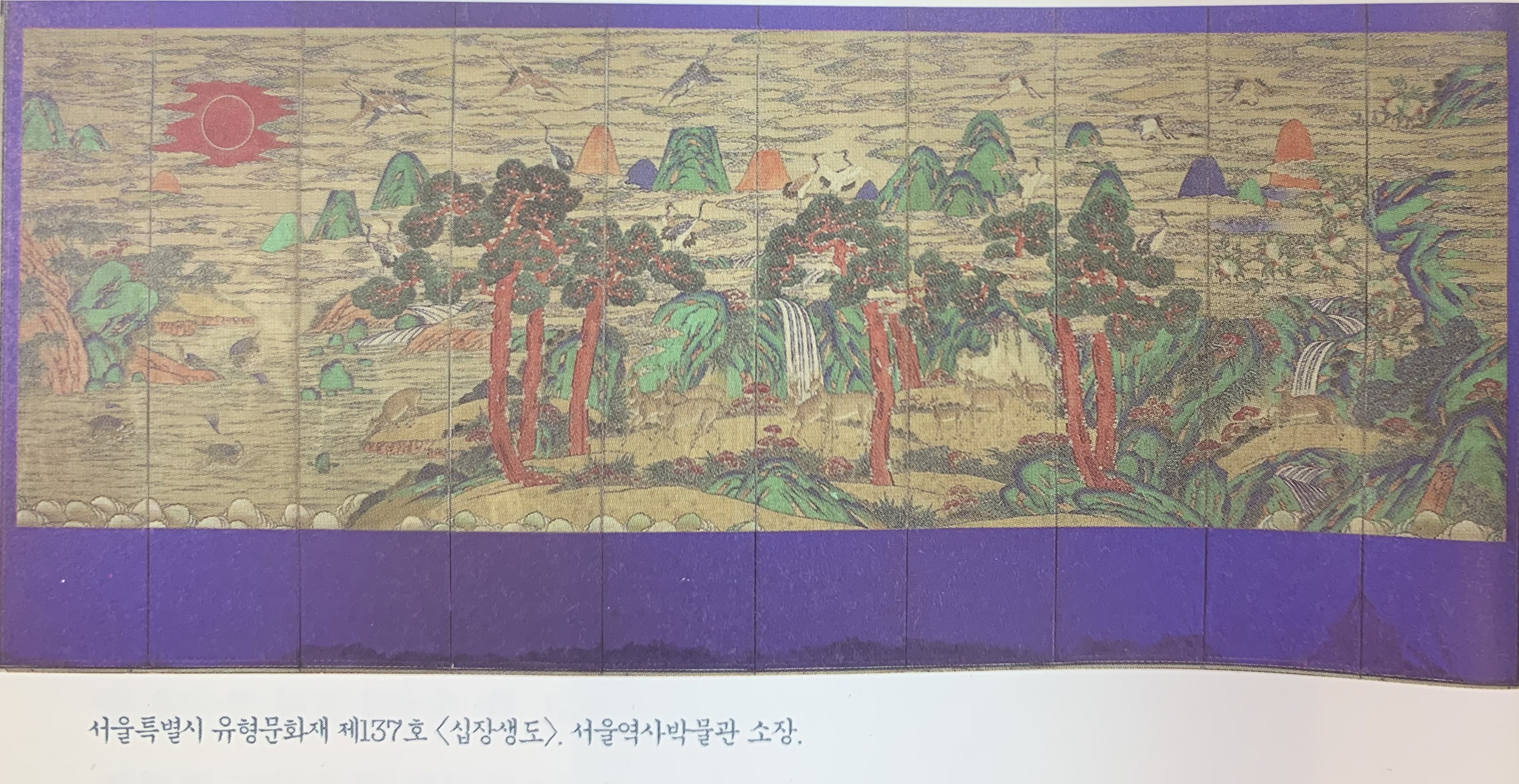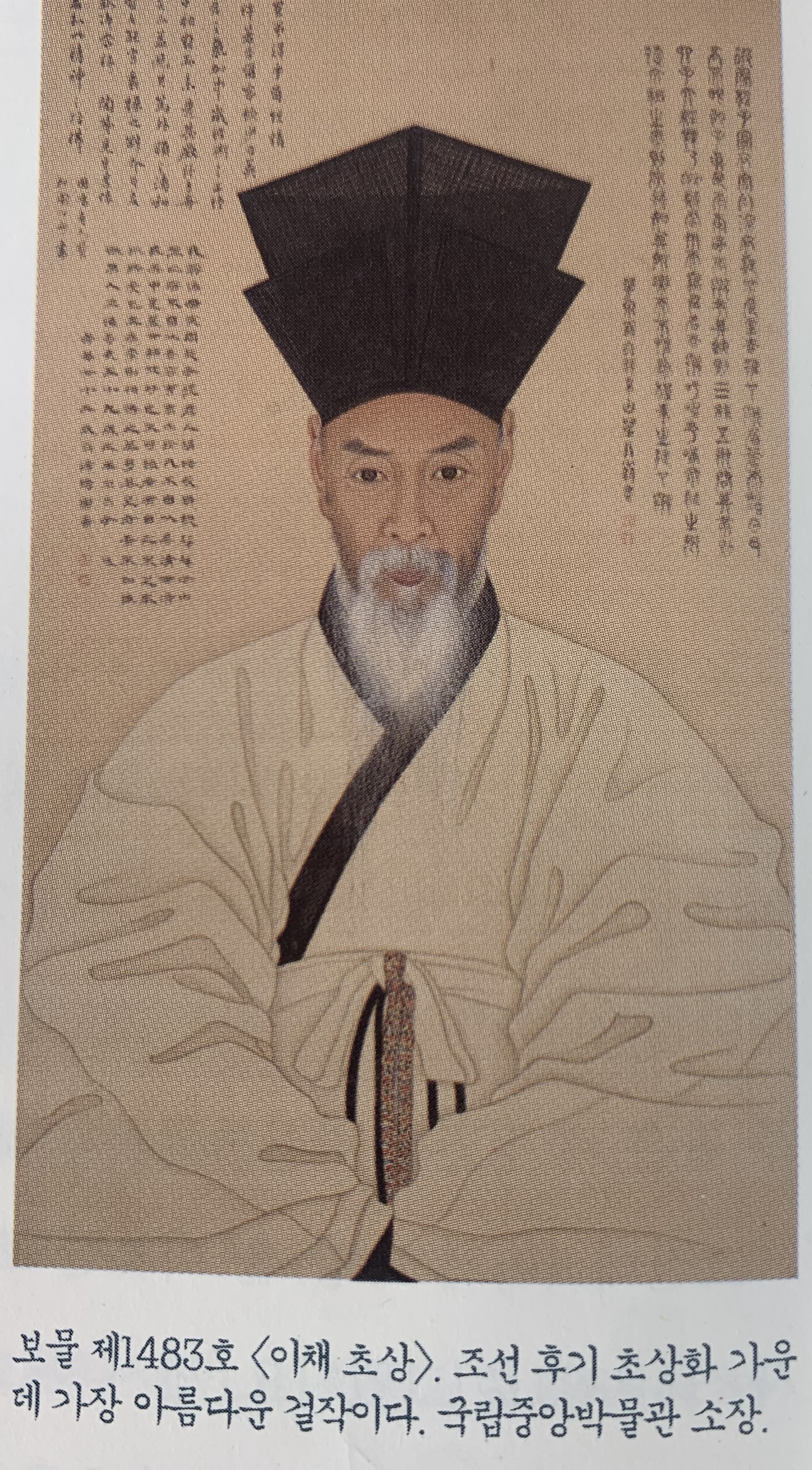따듯한 마음이 드러나는 공재 윤두서의 그림들 해남 윤씨 문헌海南尹氏文獻 「공재공행장恭齋公行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해 마침 해일海溢이 일어 바닷가 고을은 모두 곡식이 떠내려가고 텅 빈 들판은 벌겋게 황톳물로 물들어 있었다. 백포白浦는 바다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재해災害가 특히 극심하였다. 인심이 매우 흉흉하게 되어 조석 간에 어떻게 될지 불안한 지경이었다. 관청에서 비록 구제책을 쓰기는 했으나 역시 실제로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 이에 공재 윤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산의 나무를 베어내서 소금을 구워 살길을 찾도록 해주었습니다. 한 마을 수백 호의 주민이 그의 도움을 받아 떠돌아다니거나 굶어 죽는 일이 없게 되었지요. 윤두서는 단순히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가난한 이들을 구하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