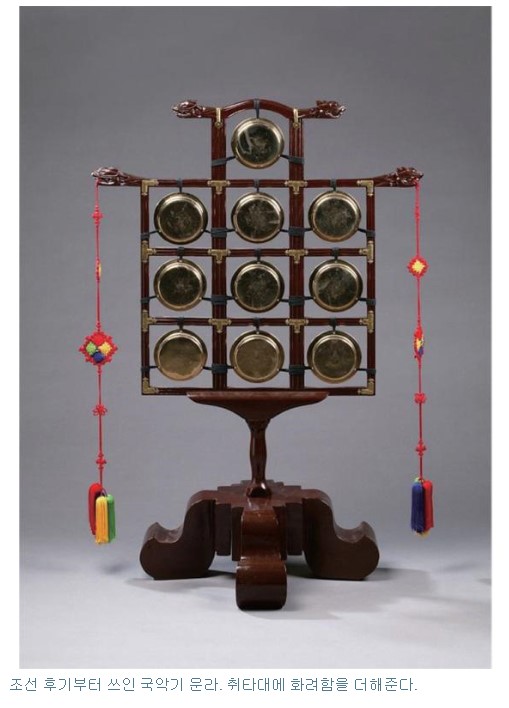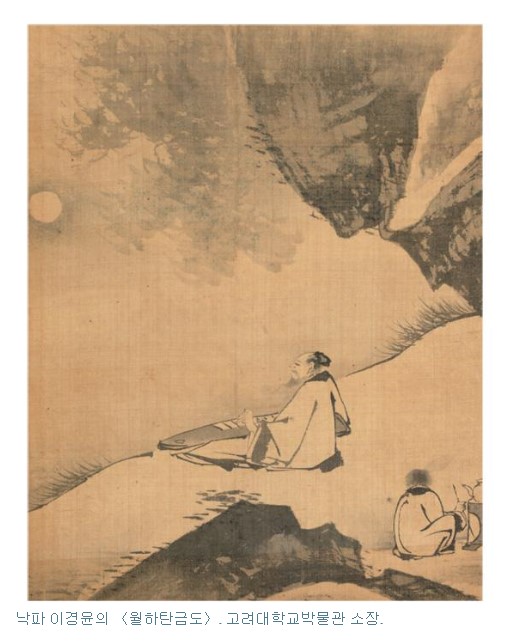우리 민요 가운데 가 있지요. 노랫말은 부르는 이에 따라 다양한데 “어~~화 농부님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니가 무슨 반달이야 초생달이 반달이로다”라는 노래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아마도 이 를 불렀던 이는 수령이나 양반들에게 다 빼앗기고 논이 반달만큼 남았었나 봅니다. 얼마나 착취를 당했으면 농사지을 땅이 반달만큼 남았는지 기가 막힐 일이겠지만 그래도 농부는 노래 한 토막으로 마음을 달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노랫말도 있습니다. “어화~어화 여어루 상~사~듸이여 우리남원 사판이다 어이하여 사판인고 부귀와 임금은 농판이요 장천태수는 두판이요. 육방관속은 먹을판 났으니 우리 백성들 죽을판이로다.” 여기서 ‘사판’이란 死板, 곧 ‘죽을 판국’을 말합니다. 흔히 “이판사판이다”라고 할 때 쓰는 ..